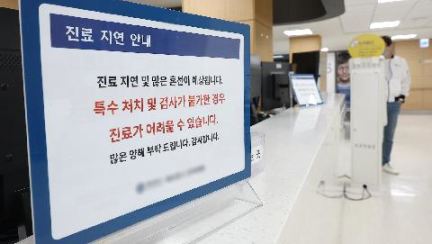필자는 대학 졸업 직전 학교 축제가 열린 서울 동숭동 마로니에광장에서 가야금을 연주했다.
법대에서 10분 정도 걸어 음대에 갔다. 서울대 초대 음대 학장인 현제명(1902~60) 선생이 서울대 의대 캠퍼스 안에 있는 목조건물 2층 음대 학장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성악가이자 작곡가인 그에게서 받은 첫 인상은 마치 레슬링 선수 같다는 것이었다. 58세에 갑자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정정했다. 덩치가 크고 얼굴은 붉었으며 남자다웠다.
“음악대학에 내년부터 국악과를 설치하려고 해. 그러니 자네가 강사로 나와 가야금을 좀 지도해줬으면 좋겠네.” 현 선생의 말은 느닷없었다. 그때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는 제안이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57년 내가 KBS 주최 콩쿠르에서 1등한 소식을 들었던 모양이다.
“며칠만 주십시오.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며칠 뒤 학장실을 다시 찾았다. 그리고 거절했다. “저는 나름대로 계획한 길이 있습니다. 음악은 좋아서 하는 것이고 제 전공이 아닙니다.”
현 선생은 어린 학생의 주장에 물러설 분이 아니었다. “지금 법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삼태기로 담아낼 정도로 많아. 법을 해서 뭐 하려고 하나.” 그는 말을 이어갔다. “자네가 지금 가야금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보배로운 건 줄 아나.” 그의 말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현 선생은 이어 결정적인 제안을 했다. “자네가 정 그렇다면 일주일에 딱 하루, 단 한 시간만 내주게. 그렇게만 해도 나는 영광으로 알겠네.”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고 하는 데에는 더 이상 거절할 방도가 없었다. 게다가 영광으로 알겠다는 데에는 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속으로 결심했다. ‘꼭 4년 동안 만 강사로 일해야겠다’. 4년을 해야 한 학생의 입학과 졸업을 모두 볼 수 있겠다는 계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서 59년부터 서울대 음대에서 강사를 시작하게 됐다.
현 선생은 남산에 피아노를 갖다 놓고 음악학교를 세운 뒤 서울대로 그 학교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다. 서울대 음대 설립자나 다름없고 학생들을 아들딸처럼 생각했다. 그런데 60년 4·19 이후 학생들이 “음대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라”며 그를 비난하는 데모를 하자 충격을 받아 쓰러졌고, 일주일 뒤 별세했다. 나를 처음 서울대로 이끌었던 현 선생의 타계는 꽤 큰 충격이었다. 나는 63년 개학을 얼마 앞두고 당시 김성태 학장과 이혜구 국악과 과장의 집에 찾아가 “강사를 그만두겠다”고 간청했다. 두 분 다 극구 만류했지만 ‘꼭 4년 동안만 강사로 일해야겠다.’는 초심대로 끝내 그만두었다.
황병기<가야금 명인>
![[오늘의 운세] 6월 1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속보] 검찰, 이재명 추가 기소…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2/d6e8bbf8-3a6a-47a3-8d3c-4bfc168b4c42.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