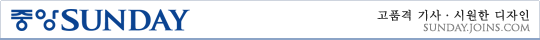최근 인문학의 위기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인문학계뿐만 아니라 언론, 심지어 대선 후보까지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용이 최우선시되는 현대사회에서 당장 먹고사는 데 도움이 안 되는 역사·철학·문학 등 소위 '한가한'학문에 대한 관심은 쉽게 살아나지 않는다.
또한 상당수의 인문학 대변인도 고리타분한 '도덕' 교육의 논리를 사용해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인문학이 개개인의 창조력을 발달시켜 지식경제 시대의 돈벌이에 도움이 된다는 실용적 경영학을 강의한다. 이러한 인문학 찬양론은 인문학을 경영학의 한 범주로 전락시키거나, 아니면 취미생활의 범주 정도로 주변화할 위험성이 있다. 과연 이 시대의 인문학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학문일까?
국제정치라는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필자가 인문학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국제정치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라는 현상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다. 국제정치에서 소프트 파워는 상대 국가가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끌려오게 하는 힘이라고 정의한다. 전문적인 내용은 좀 복잡하지만 일단 군사력과 같은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큰 무리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군사력과 같은 물리력이 아니고 뭔가 '소프트'한 것으로 상대방을 움직이려면 문화·사상·예술 같은 국가의 인문학적 깊이와 넓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가 유럽·미국·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에 끌리는 이유는 그들의 경제력·군사력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시각에서 미화하고 또 다채롭게 장식해 퍼뜨린 역사·철학·문학·예술·과학지식 등 소위 문명의 힘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장구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유럽의 문명이 홀로 빼어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근대 들어서 강한 인문학을 키우고 활용해 우리가 부러워하는 수많은 전통을 재발견하고 '발명'하고, 또 풍부하게 만들었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 역사를 풍부하게 만드는 참신한 시각과 이론, 역사에 스며든 예술과 철학, 그리고 품위 있는 정치와 시민사회를 만드는 역사와 철학과 예술은 인문학의 힘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들 국가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소프트 파워로 작동한다.
그런데 이러한 소프트 파워는 일상을 살아가는 개인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 그리고 다원화된 민주주의의 시대에서 우리는 국경을 초월해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깊이 있는 멋과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식경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으며, 사람들을 민주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대에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국민 개개인이 문화적인 아름다움과 깊이, 즉 인문학적 소양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한 교육 목표가 돼야 하며,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신과 국가의 품격을 높이게 된다.
최근 조기유학이 늘고 영어에 대한 종교적 열풍이 불고 있다. 물론 외국을 알고 영어를 잘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 사람이 한국을 모르고 외국과 영어만을 잘 알면 오히려 한국과 외국 모두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한국 사람의 소프트 파워는 강한 한국의 인문교육에서 나오고, 그 기초 위에 전문적인 지식과 외국어를 쌓아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자칫 외국에 대한 지식만 깊어지면 우리는 그들의 소프트 파워 세계로 빨려 들어가 자신감을 잃고 또 지식경제의 시장도 잃게 된다. 한국의 다음 지도자가 이러한 인문학과 소프트 파워의 국가적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살려나가기를 기대한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미래전략연구원장

![[단독] 저출생부 '박정희 모델'로 간다…"전 부처 저출생 예산 심의 검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5/9d4e3863-f8a6-4dc4-ab4d-1c2f3388666c.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