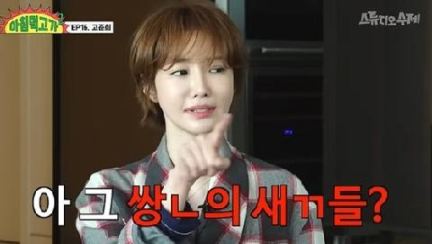출타 길의 서태후(가운데) 앞에 애견 ‘하바’가 쭈그리고 앉아 있다. [김명호 제공]
출타 길의 서태후(가운데) 앞에 애견 ‘하바’가 쭈그리고 앉아 있다. [김명호 제공] 서태후는 경극(京劇)과 예쁜 신발, 개(狗)와 옥(玉)을 좋아했다. 이화원의 경극 공연장을 직접 설계했고, 신발에 수를 놓아 여관(女官)들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극과 신발도 개와 옥에는 미치지 못했다.
사진과 함께하는 김명호의 중국 근현대<30>
개를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혈통 보존과 감별에 관한 연구는 일가를 이룰 정도였다. 황실견 사육장인 어구옥(御狗屋)에 볼일이 생기면 조회도 대충 끝내버리곤 했다.
어느 날 아침 조회를 기다리던 대신들은 뛰고 자빠지고 구르며 태후(太后)의 처소로 달려들어가는 태감(太監)의 황급한 모습을 보았다. 천재지변이나 반란이 발생한 줄 알았다. 잠시 후 간편한 복장의 태후가 나타나 화려하게 차려입은 대신들 사이를 빠른 걸음으로 지나쳤다. 태후의 발길이 앞을 스칠 때마다 꿇어 엎드려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직함과 성명을 외쳐대는 소리들이 장관을 이루었다. 태감의 보고는 태후가 귀여워하는 흑옥(黑玉)이 새끼를 네 마리 낳았다는 것이었다.
대나무로 만든 사합원 모양의 어구옥에 거의 도달했을 때 태후는 옆에 있는 더링(德齡, 1886∼1944)에게 “장구한 역사가 있는 종자들이다. 만주인들은 오래전부터 ‘하바(哈巴)’라 부르며 애완용으로 키웠다. 우리 조상들이 만리장성을 넘어 중원으로 들어올 때 이들도 함께 왔다. 그 후로 ‘베이징 개(北京狗)’라고 부르게 됐다”고 말했다.
태후가 올 때마다 개들은 조련사의 구령에 따라 요란하게 짖어대며 소리와 앞발을 드는 게 다를 뿐 조정의 대신들이 하는 것과 흡사한 예를 행했다. 20마리를 초과하게 되면 태후는 이상이 있는 개들을 지적했다. 지적은 퇴출을 의미했지만 절대로 죽이거나 잡아먹지는 못하게 했다. 시장에 데리고 나가 팔게 했다. 황실에서 나왔기 때문에 고가로 팔려나갔다. 태후는 태어난 네 마리 중 이마에 흰 점이 있는 한 마리에게만 반옥(斑玉)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네 마리가 태어나면 세 마리는 불량품이게 마련이다. 커가면서 다리가 짧거나 몸통이 길거나 털이 거칠다. 7일 만에 눈을 떠야 10일 만에 꼬리를 잘라줄 수 있다”고 했다. 더링은 7일 만에 눈을 뜬 것은 반옥 하나였다고 회고록에서 밝혔다.
서태후는 노년에 들어서도 자색(姿色)에 자신이 있어 했고 장신구에 신경을 많이 썼다. 대신이나 총독 혹은 외국 대사들이 예물로 보낸 것을 주로 착용했다. 태후는 그중에서도 옥으로 만든 것을 제일 좋아했다.
여러 곳의 총독과 군기대신을 역임한 장즈둥(張之洞, 1837∼1909)은 소문난 옥광석 수집가였다. 수집해 놓았던 천연 옥광석 중에서 태후를 위해 미옥(美玉)을 한 덩어리 추출해냈다. 완벽한 녹옥(綠玉)이었다. 초승달 모양의 귀걸이와 수촉(손톱 보호용 장신구)을 만들어 예물로 보냈다. 태후는 “소장품 중에 이보다 뛰어난 것은 없다”고 감탄했다. 여관들은 바로 착용할 줄 알았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였다. 거울을 보고 귀걸이와 수촉을 응시하기를 반복하더니 “내 얼굴이 흠집 하나 없는 옥귀걸이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손에도 주름이 많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에게 어울릴 물건을 늙은이가 착용하면 고목 같은 몰골만 더 드러난다. 창고로 보내라. 가끔 가서 보기만 하겠다”고 했다.
장즈둥의 심미안은 탁월했다. 총명하고 세심한 사람이었다. 여름이 임박했고 태후가 아직 젊다는 것을 찬미하기 위해 젊은 여자에게 어울리는 옥을 예물로 선택했다. 그러나 서태후는 더 총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