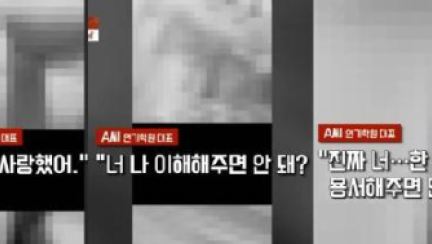지난 7월 이건희 삼성 회장이 반도체 부문을 질책(본지 9월 30일자 보도)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취재팀은 적잖이 놀랐다. 그 강도가 이례적이었기 때문이다. 그 속엔 “3년을 속았다”는 말도 있었다.
3년 전이라면 2004년이다. 그해 삼성전자는 순이익 10조원을 돌파하며 한국 산업사를 새로 썼다. 최대 공신은 반도체였다. 하지만 이 회장의 진단에 따르면 위기는 바로 그 성공으로부터 싹튼 셈이다.
‘성공의 함정’은 보통 지나친 낙관, 그리고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지키기 경영’이란 형태로 나타난다. 현장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삼성전자 출신의 한 엔지니어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기존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며 “이런 분위기에 한계를 느껴 퇴사를 결심했다”고도 했다. 그의 말을 더 들어보자.
“반도체라는 게 하나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험해 보려면 적어도 엔지니어 50명이 달라붙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느니 당장 닥친 과제나 처리하자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더구나 부서별로 실적 평가를 받는 시스템에서 부서 간 협력도 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금 삼성 내부에서도 힘을 얻고 있다. 윤종용 부회장의 1일 월례사에도 그런 고민이 엿보인다. 그는 “창조는 시행착오를 거쳐 만들어지며, 최선을 다한 실패에 대해서는 이를 용인하며 도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도 삼성전자의 변화를 고대하고 있다. 특히 신사업 발굴과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전략, 조직문화의 변화 등 근본 처방을 바라는 목소리가 많다. 기존의 구조조정 방식에 대해선 삼성 내에서조차 “인력을 줄이고 이면지 활용하는 식의 대응으로 현재의 정체상태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이 회장이 ‘회초리’를 들었다는 사실에 불안감보다는 기대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회장이 직접 조직에 긴장을 불러일으킬 때마다 삼성은 한 단계씩 진화해왔기 때문이다. 1993년 ‘신경영’을 선언하던 당시가 그랬다. 발단은 일본인 고문이 삼성 제품의 디자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꼬집은 ‘후쿠다 보고서’였다. 한 애널리스트는 “삼성이 주저앉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 박자 늦은 감은 있지만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됐고, 그걸 가능케 할 풍부한 자산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삼성 그룹은 반도체 총괄에 대한 한 달여간의 경영진단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진단의 강도와 범위는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한다. 착수 전 반년 동안 사전 준비를 했고, 사내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과 협력업체까지 샅샅이 훑고 의견도 들었다는 전언이다. ‘제2의 후쿠다 보고서’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늘의 운세] 6월 1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