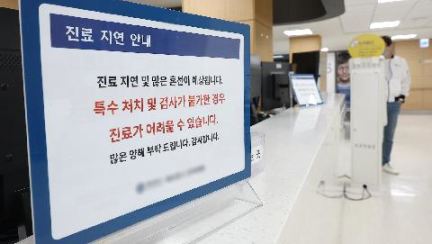지난주 방송인 허수경(40)씨의 싱글맘 선언이 화제가 됐다. 허씨는 두 번째 이혼 후 정자를 기증받아 시험관 아기 시술을 거쳐 임신에 성공했단다. 대부분의 미혼모와 달리 임신이 실수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됐고, 그 결정 과정에서 남자의 개입이 철저히 배제됐다는 점에서 매우 파격적이다. 아이 아빠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생물학적 아빠는 중요하지 않다”고 일축한 데서도 그의 결연한 의지가 읽힌다.
‘생물학적 아빠’라는 단어는 다분히 기능주의적이다. 허씨의 경우처럼 사람에 따라 남자는 내가 원하는 결과(아이)를 갖기 위해 필요한 요소(정자)를 제공하는 존재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 의미의 싱글맘이 점차 늘어나면 대형 병원이나 마트에서 ‘생물학적 아빠’라는 상품을 카트에 담을 그날이 오지 말란 법도 없다. 최근 종영한 드라마 ‘불량커플’의 주인공 김당자(신은경)처럼 ‘결혼은 싫지만 아이는 낳고 싶다’는 미혼 여성들의 판타지나, ‘남편은 아이의 아빠로서 의미가 있을 뿐’이라는 S같은 기혼 여성들의 일시적 착각이 이러한 상상을 부추긴다.
그러나 아빠의 존재 가치나 의의가 생물학적 그 이상이라는 사실은 허씨 이전의 수많은 싱글맘이 털어놓는 고충에서 이미 확인이 됐다. 싱글맘은 어쩔 수 없는 결과이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이라기엔 아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다. 한 결혼정보업체가 최근 재혼 대상자 826명을 대상으로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니 전체 응답자의 60% 이상이 자녀양육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 ‘엄마·아빠의 빈자리’를 꼽았다. 나와 아이만 있으면 온 세계가 충만할 것 같은 최면이 이내 풀리는 것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러한 현실을 체감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 태어날 아이 입장에서 보면 ‘아빠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것일 수 있다. 사회적 소수의 길을 택한 허씨와 태어날 아이가 겪을 유·무형의 어려움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면서도, 그의 결정에 100% 흔쾌히 박수를 보내기 힘든 이유다.
기선민 기자
![[오늘의 운세] 6월 1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속보] 검찰, 이재명 추가 기소…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2/d6e8bbf8-3a6a-47a3-8d3c-4bfc168b4c42.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