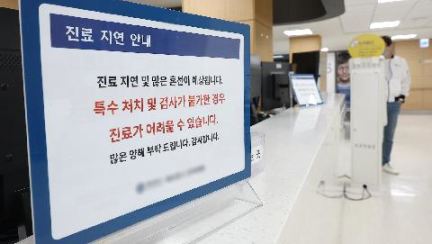‘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바뀐 법이 시행되면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은 사라진다. 그동안 수직 관계였던 검·경은 앞으로는 협력 관계로 불리게 된다. 경찰 입장에선 72년만의 대변혁으로 평가한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으로 과거 미군정(美軍政) 산하 경무국(지금의 경찰청)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달라질까.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1/14/72dff4e1-0040-494d-abfd-abedce5a75d6.jpg)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뉴스1]
경찰·검찰서 받던 조사 한 번으로
우선 경찰에서 한 번, 검찰에서 또 한 번 받아야 했던 조사를 이제는 경찰 단계에서 끝낼 수 있다. 수사의 시작과 끝이 오롯이 경찰 몫이 되면서다. 바뀐 형사소송법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연루된 피의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동안 경찰은 조사결과, 혐의가 없더라도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했다.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유·무죄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다. 불기소 의견이지만 검사는 같은 내용을 놓고 또다시 조사를 벌인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서 있는 눈' 조형물에 대검찰청이 비치고 있다.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1/14/97dfb9bd-1827-4778-b14e-0a615516e415.jpg)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서 있는 눈' 조형물에 대검찰청이 비치고 있다. [뉴스1]
물론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넘어온 사건이 검사의 보강수사를 통해 기소로 완전히 뒤집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통계상 이런 가능성은 0.21%로 상당히 희박하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오히려 검사의 이중조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500억~15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이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법정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점도 주목된다. 피의자로 검찰 조사받을 때 그동안은 검찰에서 자백한 내용이 조서에 남아 있으면 그대로 법정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검찰 조사 때 자백한 내용이더라도 법정에서 부인할 경우 이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받는 입장에서는 자백을 강요당할 여지가 줄어드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 벗어날 여지 커져
한국은 일명 ‘고소 왕국’으로 불릴 정도로 고소·고발 사건이 남발되는 편이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의 고소·고발 건은 인구 1만명당 한 해 평균 무려 86.8건에 달한다. 일본(1만명당 1.3건)과 비교하면 66배 차이다. 수사권 조정으로 연간 56만명의 피고소(고발)인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피의자 신분을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에는 검찰이 사건을 끝낼 때까지 불안한 피의자 신분을 이어가야 했다.
2018년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직장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기소 의견’ 처분을 받았다. 이후 그의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A씨는 지난해 말에서야 피의자 신분을 벗을 수 있었다고 한다. 결론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다. A씨는 “검찰에서도 잘 판단해줬지만, 결론이 나기까지 가슴을 졸여야 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의 제기 방법 명확해져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고소인이 이의 제기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서류도 없다”고 핑계를 대는가 하면 검사는 “경찰이 송치했으니 그쪽에 문의하라”는 두 기관의 핑퐁식 답변도 이뤄졌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앞으로는 경찰이 무혐의로 끝낸 사건에 대해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경찰은 관련 서류·증거물을 검찰로 보내야 한다. 이후 검사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과정서 경찰의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면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도 가능해진다.
경찰 부실수사 우려도 여전
반면, 벌써 경찰의 부실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검사의 수사지휘와 송치 후 보강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왔는데 이제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억울한 사건 당사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논리다. 한 부부장 검사는 “경찰이 마무리한 대로 재판에 넘겼을 때 과연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부실한 사건이 종종 있다”며 “기소권이 있는 검찰의 수사지휘를 제한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오늘의 운세] 6월 1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