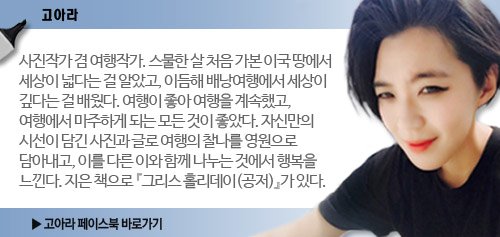크빗세르쿠르(Hvítserkur), 이곳을 가게 된 것은 우연이었다. 원래는 웨스트피오르를 떠나 바로 아큐레이리(Akureyri)로 갈 참이었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웨스트피오르에 할애하기도 했고, 너무 조용한 곳에만 있다 보니 사람이 조금이라도 복작거리는 도시가 그리워지기도 했다.
웨스트피오르와 작별하기 전, 한 카페에 들렀다. 인상 좋은 아주머니가 운영하는 소박한 카페 겸 식당이었는데 손님은 역시 나 뿐이었다. 자리에 앉아 커피를 시킨 후 작은 지도를 펼쳤다. 지도에 코를 박고 동선을 확인하고 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커피를 내줬다. 그녀가 지도를 힐끗 훑더니 말을 건넸다. “떠나시나 보네요. 어디로 가세요?”
지금껏 만나온 아이슬란드인들은 말을 먼저 거는 법이 없었다. 한번 말을 트고 나면 이토록 착하고 순박한 사람이 어디 있나 싶지만, 그전까지는 아이슬란드의 바람만큼이나 냉랭한 표정으로 침묵을 유지했다. 그래서였을까. 먼저 말을 건네준 그녀가 무척이나 반가웠다. 나는 그녀의 질문에 대한 답변 외에도 웨스트피오르 서쪽 절벽 근처에서 북극여우를 봤는데 안타깝게 놓쳤고, 길옆에 쏟아지던 작은 폭포에 얼굴을 들이밀고 물을 마셨는데 맛이 색달랐다는 둥 묻지도 않은 이야기까지 잔뜩 털어놓았다.

카페 주인은 어느새 옆 테이블 의자를 빼내 앉아 흥미로운 얼굴로 내 이야기를 들었다. 내친김에 지도를 보여주며 앞으로 가기 위해 점찍어 놓은 장소에 대한 기대감을 늘어놓았다. 지도를 관심 있게 들여보던 그녀가 한마디 툭 내뱉었다. “가장 아름다운 곳을 빠뜨렸네요.” 조금 놀란 내가 그곳이 어디냐고 묻자 그녀는 계산대 안쪽에서 신문 만한 지역 지도를 가져와 테이블에 펼쳤다. 그리곤 아이슬란드 북쪽, 툭 튀어나온 곳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렸다.
“여기에 천국 같은 곳이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바위가 있죠. 전에 살던 마을에서 가까워 자주 갔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기도 해요. 내 생각엔 당신도 좋아할 것 같네요. 꼭 가봐요.”
그녀가 따뜻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덧붙였다. 나는 고맙다는 인사를 한 후 카페를 나왔고, 그녀는 문앞에 서서 행운을 빌어주었다. 차 안에서 지도를 다시 펼쳤다. 동그라미 안에는 크빗세르쿠르(Hvítserkur)라고 적혀있었다. 아큐레이리로 가려던 계획을 미루고 이곳으로 방향을 틀었다.

크빗세르쿠르는 아이슬란드 북부 반스네스(Vatnsnes) 반도 해안가에 있는 커다란 바위였다. 웨스트피오르를 나와 1번 국도로 진입해 동쪽으로 달리다 보면 711번 비포장도로가 나오는데 이 길을 따라 약 40분을 더 가야 했다. 표지판을 따라 들어가니 차를 세울 수 있는 공터가 나왔고 옆으로는 전망대로 이어지는 샛길이 있었다. 신부의 얼굴을 처음 보러 가는 새신랑처럼 두근거렸다. 그도 그럴 것이 이곳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4시간여 전에 급하게 관광안내책자를 뒤져 사진 한 장과 간략한 설명을 훑어 본 것이 전부였다. 어느 정도 걸어야 바위의 모습이 보이는지, 얼마나 큰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알 길이 없으니 더욱 설렜다.

10분 정도 걸었을까. 나는 별안간 쑥 하고 나타난 광경 앞에 외마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 눈이 시리도록 파란 바닷속, 커다란 기암괴석이 발을 담근 채 웅장하고도 기묘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작정하고 만들어 바다에 가져다 놓은 조각처럼 섬세하고 아름다웠다. 새들이 남긴 배설물 자국이 군데군데 있었는데 그마저도 일부러 페인트칠 해놓은 것처럼 보였다. 물에 비친 크빗세르쿠르의 반영이 아지랑이처럼 흔들거렸다. 더 가까이 다가오라며 부추기는 것 같았다.

무언가에 홀린 듯 왔던 길을 되돌아가 해변으로 내려갔다. 청색 물감을 짙게 풀어 놓은 듯한 바다에는 수많은 물개가 검은 눈을 껌벅거리며 유영하고 있었다. 검은 모래사장에는 누군가가 찍어놓고 간 발자국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천천히 따라가다 보니 어느덧 바위 앞에 다다랐다. 가까이에서 본 크빗세르쿠르는 훨씬 더 크고 신비로웠다. 바위 하단에 있는 아치형 구멍 두 개가 마치 천국으로 가는 문처럼 보였다. 문 사이로 하늘빛 비단 같은 파도가 흘러들어와 내 발끝을 살짝 건드리고 돌아가길 반복했다. 마치 꿈을 꾸는 듯한 풍경에 마음도 일렁거렸다. 카페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여기에 천국 같은 곳이 있어요’. 정말 천국에 온 것 같았다.


![[속보] 22대 국회 첫 본회의부터 파행…野, 與 없이 우원식 의장 선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5/572e3a13-5a97-4ae1-b7e2-a8a2f025105f.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