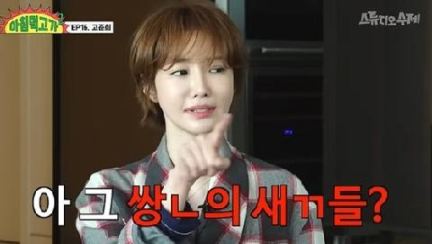조성택 고려대 교수·불교철학
지금 나에게는 칼도 經(경)도 없다.
經이 길을 가르쳐주진 않는다.
길은,
가면 뒤에 있다.
-황지우(1952~), ‘503’ 중에서
시대의 길목마다 길을 묻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
시대의 변곡점, 인생의 전환점에서 늘 떠올리는 시다. ‘사막’ ‘낙타’ ‘모래 박힌 눈’ 등의 시어는 1980년대 암울했던 시대를 상징한다. ‘일어나 또 가자’고 습관처럼 중얼거렸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던 시대였다. 무지막지한 폭력에 맞설 ‘칼’도 없었고, 구원을 약속하는 ‘經(경)’도 없었다. ‘길은,/가면 뒤에 있다’는 길이 없다는 절망의 표현처럼 다가왔다. 90년대 미국 유학 기간에는 ‘經’을 찾아 목숨 걸고 서역 길을 가던 승려들의 구법기로 읽혔다. 구법승들은 사막 곳곳에 널려있는 해골을 보면서 그 곳이 ‘길임’을 혹은 ‘길이 아님’을 기록하고 있다.
다시 시를 읽어본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과 겹쳐진다. 정치인은 자신의 길이 ‘길’임을 주장하지만 어디에도 길은 없어 보인다. 돌아보면 지난 100년 우리가 걸어 왔던 길은 있다. 식민지, 전쟁, 분단, 산업화, 민주화의 길. 앞 만보고 달려왔던, 인욕과 영광의 길이다. 그러나 앞에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 시인은 “우리 마음의 지도 속 별자리가 여기까지 오게 한 거”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서 ‘우리’ 마음을 찾아야 할까. (전문은 joongang.co.kr)
조성택 고려대 교수·불교철학
시 전문
503*
황지우
새벽은 밤을 꼬박 지샌 자에게만 온다.
낙타야,
모래 박힌 눈으로
동트는 地平線을 보아라.
바람에 떠밀려 새날이 온다.
일어나 또 가자.
사막은 뱃속에서 또 꾸르륵 거리는구나.
지금 나에게는 칼도 經도 없다.
經이 길을 가르쳐주진 않는다.
길은,
가면 뒤에 있다.
단 한걸음도 생략할 수 없는 걸음으로
그러나 너와 나는 九萬理 靑天으로 걸어가고 있다.
나는 너니까.
우리는 自己야.
우리 마음의 地圖 속의 별자리가 여기까지
오게 한 거야.
*시인의 말에 따르면 제목을 대신하는 숫자, 503은 시인 자신의 “마음의 불규칙적인, 자연스런 흐름”일 뿐 의미가 없다고 한다. 세인들은 이 시를 ‘마음의 地圖 속 별자리’라고 부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