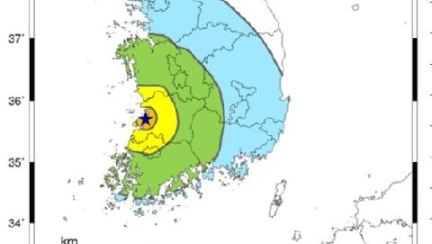영문학에 대한 소양과는 거리가 있으니 조셉 콘라드 소설 '어둠의 속'을 둘러싼 바다 건너 저쪽의 문학논쟁을 내가 귀동냥할 수 있었던 것은 백낙청 교수로부터다.
그의 처녀 비평집 '민족문학과 세계문학'(창작과 비평사, 1979년)에 담긴 '콘라드 문학과 식민지주의'가 문제의 글이다. 그걸 '어둠의 속'과 함께 기회에 되읽으며 19세기 식민주의의 어제 오늘을 가늠할 수 있었다.
소설은 콘라드의 분신으로 설정된 뱃사람 '말로'의 시선으로 전개된다. 말로는 아프리카 상아를 모으는 백인 장사꾼 '커츠'를 귀환시키는 임무를 받고 콩고 강을 배로 거슬러올라간다.
광기어린 살육현장은 바로 그 여행에서 목격을 한다. 사냥하듯 강가 흑인에게 기관총을 난사하고 "솜씨 좋지!"하고 떠벌리는 백인들 이야기는 살육극의 일부다.
현지에 도착하니 커츠는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울타리를 흑인 해골들로 장식했고, 총으로 제압한 원주민들로부터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받았다.
19세기 인종차별의 광기를 상징하는인물인 커츠는 이렇게 내뱉는다. '야만인 씨를 말려라'. 콘라드 생존 당시의 명백한 사실(史實)이고 리얼리티건만, 서구는 그걸 외면하려 했다.
이 소설을 내면탐구 여행으로 해석한 T S 엘리엇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런 허위의식의 '어둠' 보다는 할리우드가 차라리 정직했다.
인종차별의 광기가 20세기 베트남에 다시 출몰했음을 보여준 영화 '지옥의 묵시록'. '어둠의 속'을 모델로 만들어진 이 영화에서 말론 브랜도가 보여준 것은 되살아난 커츠의 광기였다.
지난주 언급한 '야만의 역사'는 인종주의 족보, 그리고 이것과 동전의 앞뒤를 이룬 끔찍한 살육극들을 보여주는데, 내내 콘라드 작품을 되뇌이며 저자는 통렬한자기반성을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몽테스키외.볼테르도 그랬지만, 서구의 멀쩡한 이들 가운데 인종차별과 무관한 이가 드물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 그는 아프리카인 2만7천명을 사상케 한 1898년 옴부르만 전투를 보고 "스릴 넘치는 화려한 게임"('야만의 역사' 1백9쪽)이라고 열광했다. 그게 당시 풋내기 종군기자 처칠의 기록이다.
심란하다. 우리는 몇개월 전 최첨단 무기가 동원된 블록버스터를 이라크를 무대로 다시 한번 보지 않았던가. 그 역시 커츠의 망령이다. 지난주 여러 책들이 증언하듯 인종차별은 서구 역사의 첫 장인 고대 그리스에서 등장한 이민족 혐오에서 시작했다.
그게 제국주의 등장 전후 생물학 등 과학으로 포장됐다면, 오늘 확인해보려는 것은 20세기 이후 인종주의는 다시 몸을 바꿨다는 점이다. 이번에는 역사학을 포함한 인문사회과학에 유럽 중심주의 형태로 스며들었다.
학문의 옷을 걸치고 대학 아카데미즘에, 우리의 지식 속에 똬리를 튼 것이다. 서울대 최갑수 교수가 '유라시아 천년을 가다'(사계절)에서 근대학문이야말로 유럽 중심주의를 떠받치는 상부구조라고 했던 것도 그 맥락이다.
에드워드 사이드가 비판하려 했던 '오리엔탈리즘의 구조'에 대한 지적이다. 요즘 출판물의 한 흐름이 이런 비판 정신의 등장이다. 9.11 이후 이슬람 서적 붐, 서구 다시 읽기 붐이 요즘 들어서는 '각론'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그게 우리사회 지적 성숙의 한 모습이다.
조우석 출판팀장
![[오늘의 운세] 6월 1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