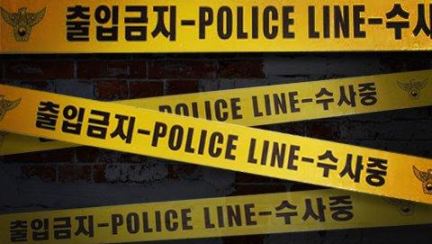휠체어 앞에 소형 컴퓨터와 연결된 흑백 모니터가 매달려 있다. 화면에는 2600개의 단어가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돼 있다. 단어를 따라 움직이는 커서가 원하는 단어 위에 놓이면 마우스를 클릭한다. 그러고는 다음 단어. 1분에 10개 단어가 고작이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장을 만들고 나면 음성합성기가 미국식 악센트로 문장을 읽는다. 그런 기계음을 통해 10년 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만난 스티븐 호킹 박사는 말했다.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강의하고 점수 매기느라 연구를 못 했을 겁니다. 루게릭병이 나를 이론물리학자로 만든 셈이지요."
그렇다고 루게릭병이 신의 은총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신은 죽음을 앞둔 병자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푼다. 고통의 극한상황에서 의식을 잃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병자는 고통을 덜 느끼며 죽음을 맞게 된다. 하지만 루게릭병 환자들에게는 신이 이런 자비를 베푸는 걸 잊은 것 같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의식이 흐려지지 않는다. 의식이 뚜렷한 상태에서 서서히 호흡이 어려워지고 심장이 딱딱해져 가는 고통을 상상해 보라. 그래서 의사들은 이 병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병'이라 부른다.
많은 루게릭병 환자는 그러나 신의 건망증을 탓하지 않는다. 원망만으로 보내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 짧고 소중하기 때문이다. 사상의학을 창시한 이제마도 하체에 힘이 빠져 자유롭게 걷지 못하는 해역병을 앓았다. 곧 루게릭병이다. 그는 자신의 지병 때문에 의학에 관심을 갖게 됐으며 오직 학문적 열정만으로 사상의학을 집대성했다. 호킹 박사가 불후의 특이점 이론과 빅뱅이론.양자중력론 등을 정립한 것도 모두 발병 이후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의 주인공 모리 슈워츠 교수 역시 죽는 순간까지 삶에 대한 긍정적 자세를 잃지 않았다. 자신의 죽음을 언론에 공개하며 사람들에게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자 했다. 제주도의 풍경만을 찍어온 사진작가 김영갑은 치료도 거부한 채 사랑하던 제주의 자연 속에서 불꽃 같은 삶을 마쳤다. 자신의 이름을 병명으로 남긴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루 게릭은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라고 외쳤다. 38세라는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면서 뭐 그리 행복할까마는 그들보다 평온한 삶을 살면서도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허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끄럽다.
이훈범 주말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