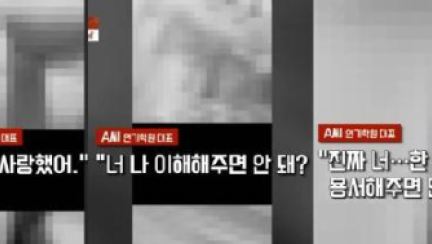택시운전기사가 시집을 냈다. 이른 새벽부터 심야까지 서울거리를 누비면서 그가 본거리와 그속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기사로서의 애환을 읊은 시들을 실었다.
이들 시속에서 운전기사는 거리에서 본 오늘의 현실이 물질만능속에 타락되고 있음을 가슴아파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오염된 도시속에 오히려 잎푸르른 포플러처럼 땀흘리며 일하고 건실하게 살아가려는 이웃이 있음을 믿었고,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리라고 다짐하였다. 시인이 아닌 한 택시운전사가 내놓은 이 조그만 시집은 노동의 신선함을 말해주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밝혀주고 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의 시집못지 않게 감명을 준다.
서울1아3398호 전진교통소속택시 운전사인 김용식씨(31)-.그가 낸 시집의 제목은 『흙과 영혼』.
『핸들을 잡고 밤깊은 무규동에 들어섰을 때, 먼지 이는 공사장 옆을 지날때, 신호등앞에 서서 몰려가는 인파를 바라볼때 저의 가슴에 와닿는 뭉클한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듬어서 시로 쓰면서 이렇게 써도 시가 되겠는가 의심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했습니다만 시로 쓰지 않고는 견딜수 없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김씨에게 밤의 무교동은 낭만이 사라지고 오직 타락한 정염의 열기만 가득한 곳으로 보였다.
「한 사내가/술을 마실때는/몸도 마셔/여인들 에게/구린내 나는 금빛 비밀을/모두 고백한다」 (『무교동의 밤』중에서)
김씨는 전북완주군구이면에서 태어나 구이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일거리를 찾으러 서울에 올라왔다. 과자도매점점원·구두닦기·학교사환을 하다가 연탄배달원이 되었다. 그러다가 연탄배달차조수로 들어섰고 운전을 배웠다. 그는 부인 한병순씨(33)와 딸 성경양(3)등 세식구가 2백만원짜리 전세집에 산다. 그런 그에게 무교동의 흥청거림이 어떻게 보일것인가? 『그럴때면 지금도 만경들에나가 흙을 일구고 계시는 아버님을 생각합니다. 일한만큼 열매를 맺어주는 땀을 믿는 아버님처럼 핸들을 잡고 열심히 거리를 달려 이도시가 주는것만큼을 받아 건실하게 살아가자고 다짐하지요.』
과속않고, 눈치껏 위반하지않고 운전기사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생활상은 김씨의 경우를 들어보면 잘알수 있을것같다.
김씨는 월급이 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하루 입금 6만2천원을 채우지못할 때가 많아 월급을 22만원 받을때도있고 25만원받을 때도 있다고 말한다. 그는 『합승』이란 시에서 「복잡한 거리에서/우리가 합승을, 하고 싶어서/합승을 하는가」라며 운전사들의 고통을 절규한다.
김씨는 또 『송사리의 노래』에서 운전기사를 서울이라는 강에 사는 송사리로 비유하면서 「살찐 붕어들과 재빠른 피라미들이 몰려와/송사리는 황급히 쫓기고」라고 표현하기도하고 「투망끝에 달린/수백개의 하얗게 빛나는 차디찬 납덩어리에/몸을 두들겨 맞아서」라면서 투망식 단속을 고발했다. 김씨는 거짓을 모르고 살아가자는 오늘의 건전한 소시민이다.
그는 땀흘려 일하는 것에서 보람을 찾고 진실하게 살려고 했기때문에 시를 쓸수있었다.
그가 자신의 서툰 시를 어느 시인에게 가져갔을때 그 시인은 부끄러움 없이 시를 발표하라고 격려했고 출판사에서도 흔쾌히 시집을 내어주었다.
우리의 건실하고 애정있는 이웃인 김씨는 혼탁한 서울이라는 강의 송사리가 아니고 「서울강의 은빛 은어」로 다가온다. <임재걸기자>
<거리에 서면>
거리에 서면
이 세상에서
깨끗한 사람들만이
호루라기 소리에 놀란다.
발악을 하며
끌려가는 사내를
깨끗한 사람들만이
바라보며 한없이 운다.
깨끗한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서
흙속에 살며
깨끗한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며
아무도 모르게 추운 언덕을
홀로 걸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