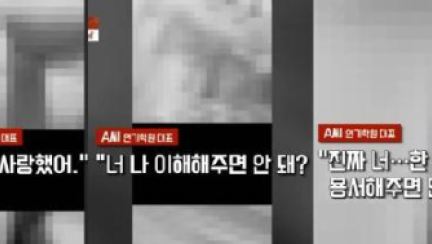징크스. 말만 들어도 섬뜩하다. 야구든 축구든 농구든 프로 선수들은 대부분 징크스가 있다. 프로 게이머도 예외는 아니다. 경기를 앞둔 게이머들은 바짝 긴장한다. 그때 '복병'처럼 징크스가 나타나 애를 먹인다면 큰일이다. 그래서 징크스에 얽힌 게이머들의 일화도 다채롭다. 나의 징크스는 유별나다. 경기장 온도에 유독 민감하다. 만약 춥다고 느끼면 십중팔구 패하고 만다. 이유가 있다. 열이 많은 체질이라 손에 땀이 많이 나는데 마우스를 오래 쥐고 있을 때 문제가 생긴다. 경기장이 추우면 손의 감각이 둔해진다. 그래서 가끔 마련되는 결승전과 특별전의 야외무대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모두가 징크스 때문이다.
징크스는 또 있다. 꼭 안경을 써야 한다. 나는 평소 안경을 잘 안 쓴다. 그러나 연습 때나 경기 때는 안경을 쓴다. 프로 게이머 생활을 시작한 뒤 시력이 급격히 나빠진 것이다.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씩 모니터를 뚫어져라 봐야 하기 때문에 이제 안경은 게임 필수품이 됐다. 경기장에 안경을 깜빡 잊고 간 적도 있었다. 평소 안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범한 것. 그땐 상당히 힘들었다. 눈이 충혈됐고, 흩어진 초점을 잡기 위해 눈에 더 힘을 줘야 했다. 결국 집중력이 분산됐고, 경기에서 지고 말았다.
손 풀기(Warm Up)도 빼놓을 수 없다. 손 풀기를 안 하면 패한다. 운동 선수들이 경기 전에 몸을 푸는 것과 마찬가지다. 프로 게이머에게 손을 푸는 시간은 절대적이다. 불과 몇 초 차이 승패가 갈리는 까닭이다. 또 손이 마음대로 움직여 줘야 준비한 전술과 전략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 그러나 경기 시간에 아슬아슬하게 맞춰 도착한 날은 손 풀기를 건너뛰고 만다. 이런 경기는 꼭 패한다. 그래서 늘 경기장에 미리 도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쓴다. 그리고 경기 직전까지 마우스 키보드를 쥐고 손을 푼다.
마지막 징크스는 쌍꺼풀이다. 경기장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나는 거울을 본다. 쌍꺼풀이 한쪽에만 생기면 경기가 불안해진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풀려고 눈에 힘을 주고, 손으로 계속 비비기도 한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는 쌍꺼풀이 경기 전에는 꼭 승패의 조짐처럼 느껴진다.
이런 징크스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동고동락하는 동료 게이머도 마찬가지다. '운영의 마술사'라는 별명을 가진 저그플레이어 박태민 선수는 경기 전날 수면 시간에 민감하다. 평소보다 잠을 많이 자면 꼭 패배한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내가 본 박 선수는 경기 전날은 아무리 피곤해도 남보다 일찍 자지 않는다. 오히려 '좀 덜 자야지'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다.
첫회에서 소개했던 '치터테란' 최연성 선수의 징크스는 아주 특이하다. 자신이 사용하는 마우스 패드와 키보드가 정확하게 직각을 이루어야 한다. 아니면 경기에서 진다는 것. 그래서 그는 경기장에 갈 때 스카치테이프를 챙긴다. 자신의 장비를 세팅할 때마다 각도를 유지시켜 줄 테이프가 필수품이기 때문. 행여 경기 중에 마우스 패드가 조금 비뚤어져도 큰일이고, 키보드가 약간 밀려 둘 사이의 각도가 직각이 안 돼도 큰일이니 말이다.
나는 징크스를 패배의 동의어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경기를 앞둔 마음가짐, 완벽을 기하려는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이다.
임요환 <프로게이머>


![[오늘의 운세] 6월 1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