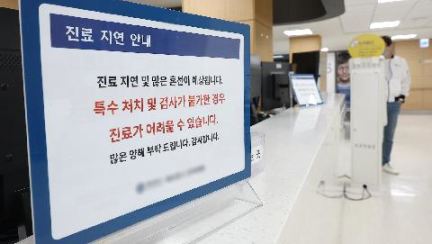동영상은 joongang.co.kr [최효정 기자]
동영상은 joongang.co.kr [최효정 기자]자 봅시다, 천 석이나 들어가는 큰 종은
請看千石鐘
웬만한 큰 종 채로 치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겠지요.
非大叩無聲
만고의 저 지리산 천왕봉은
萬古天王峰
하늘은 울어도 울지 않는답니다.
天鳴猶不鳴
- 남명(南冥) 조식(曺植 1501~72) ‘천왕봉(天王峰)’

고등학교 시절 근정(槿丁) 조두현(1925~89) 선생이 주재하시는 한문 시간에 이 한시를 배웠다. 10대 어린 나이였지만 남명 선생의 웅혼하고 웅장한 기개가 좋았다. ‘나도 천석종(千石鐘)이 되어 보리라’ 결심했다. 쉽게 울지 않는, 그러나 울었다 하면 세인의 가슴에 오래도록 여운이 남는 그런 큰 종소리가 되어 보자 싶었다.
전북 김제 농부의 집에서 학교가 가까운 익산 이종형님 댁으로 가니 현관에 ‘인지위덕(忍之爲德)’이란 편액이 걸려 있었다. ‘참는 것이 덕이다’란 뜻도 좋았지만 붓글씨가 더 눈에 들어왔다. 법조계에서 일하시던 형님을 찾아온 촌부들이 ‘제 아이 좀 살려주세요’ 우르르 엎어지는 걸 보니 법학은 할 게 못되는구나 싶었다. 법과대학에 갔지만 법 공부는 한 줄도 안 했다. 대신 글씨를 썼다. 한문 공부하고 서법 배운 지 50년, 이제야 천석종의 품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
서예의 길에 입문하며 추사(秋史) 김정희(1786~1856) 선생을 극복하리라 마음먹었다. 천석 이상 가는 큰 종이었던 추사에 비견되려면 도대체 얼마나 더 노력해야 할까. 큰 서예가가 되어보고자 하는 꿈을 지니고 오늘도 벼루 100개를 구멍 내고 붓 1000자루로 무덤을 이루리라 각오한다.
박원규 서예가
![[오늘의 운세] 6월 1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