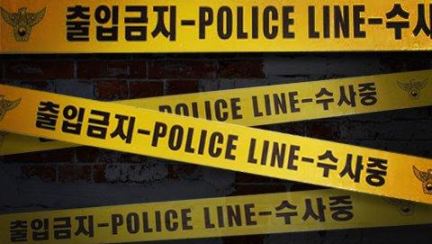김대중(DJ) 대통령의 최대 치적은 무엇일까. 이 정권 관계자들은 첫손에 환란극복을 꼽는다. 그러나 천문학적 공적 자금과 하이닉스로 대변되는 실패한 빅딜 등을 감안하면 이게 오롯이 DJ의 업적은 아니다.
오히려 금 모으기에 동참한 국민과 좋은 물건 내다 팔아 달러를 번 기업 및 노동자들의 몫이 크다. 찬란했던 노벨 평화상도 측근들의 부정부패와 도청.언론탄압 시비로 빛이 바랬다. 햇볕정책은 최근 북핵 사태로 치적이란 말조차 꺼내기 어렵다.
그러면 DJ에겐 뭐 내세울 만한 게 없을까. 치적이란 표현이 무엇하지만 제대로 된 나라 만드는 데 기여한 게 한 가지는 있다. '좌파의 커밍아웃'이랄까. 그간 무슨 죄라도 지은 듯 숨죽이고 지내던 좌파들이 당당히 자기 주장을 하는 시대를 연 것이다.
물론 이게 지나쳐 '우파=수구.반통일 세력'으로 치부되는 무리도 있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오른쪽 날개로만 날아온 우리 사회는 좌파의 커밍아웃으로 외형상으로는 건강하게 비상(飛翔)하는 새의 모습을 갖췄다. 이제 좌익, 혹은 좌파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
물론 아직 금기는 있다. 지난해 한바탕 소동을 일으킨 빨치산이 그렇고, 월드컵 때 누구나 빨간 셔츠를 입었지만 빨갱이란 말은 여전히 터부다. 최근 인수위와 전경련의 갈등을 보면 사회주의란 말도 이 범주에 속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사회주의라는 말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 사민주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유럽엔 사회주의 정권이 많다. 독일 기본법(헌법) 20조는 아예 "독일은 민주.사회국가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전경련 金상무가 비슷한 얘기를 했다면 아마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를 지칭했을 것이다. 경제전문가인 그가 10여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거덜난 정통 사회주의를 의미했을 리 없다.
뮐러 아르막이 1946년 처음 사용한 이 용어는 '사회적 책임을 동반한 시장경제 체제'다. 사회보장망을 구축해 자본주의의 약점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라인강의 기적'과 '노동자의 천국'은 이를 통해 가능했다.
그래서 이번 파동을 지켜보면서 아쉬움이 남는다. 인수위 측이 "그래, 우리가 바라는 건 사회적 시장경제다. 그게 어때서?"라고 답하는 여유는 없었을까. 성장과 분배라는 거대 담론을 통해 우리 사회 인식의 지평을 넓힐 좋은 기회가 시퍼런 서슬에 날아간 느낌이다.
유재식 베를린 특파원
![[오늘의 운세] 6월 1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