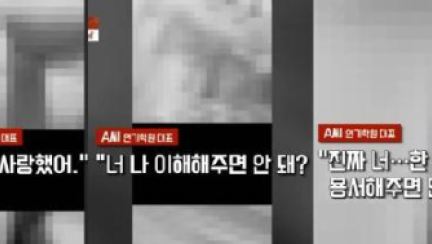대구 출신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으로 벌써부터 관가에선 새 정부 출범 후 TK(대구·경북) 출신들이 대거 요직에 발탁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돌기 시작했다. 특히 검찰·경찰·국세청 등 권력기관 주변이 어수선하다. 김영삼 정부 때 PK(부산·경남)→김대중 정부 때 호남→노무현 정부 때 PK→이명박 정부 때 TK로 이어지는 대통령 동향 출신들의 약진 현상이 이번에도 되풀이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박 당선인은 지난달 20일 당선 인사에서 “과거 반세기 동안 극한 분열과 갈등을 빚어왔던 역사의 고리를 화해와 대탕평책으로 끊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그가 핵심 국정 과제로 내건 국민대통합을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지역균형 인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에선 1963년 박정희 정권 출범 이후 김대중·최규하 전 대통령 때를 제외하곤 계속 영남 출신 대통령이 이어지면서 권력의 영남 편중이 고착화됐다. 이런 현상은 사회 각 부문으로 전이돼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켰다.
전문가들은 박 당선인 주변의 동향 인사들이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라도 대탕평의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경우에 따라선 ‘역차별’ 논란이 나올 수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를 이유로 주요 공직에 기용되는 행태도 극복 대상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논란을 빚었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인사나 총리실 민간인 사찰 파문 때 드러난 ‘영포회(영일·포항 출신 공무원 사조직)’ 문제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과거 김영삼 정부에서 ‘나사본’, 김대중 정부의 ‘연청’, 노무현 정부의 ‘노사모’ 등도 구설에 올랐던 사조직들이었다.
방송통신대 강성남(행정학) 교수는 2일 “‘고소영’ 인사는 철저히 대통령과의 ‘정서적 공감’ 때문에 이뤄진 인사여서 국민들이 공정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 없었다”며 “박 당선인도 박근혜계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써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상시적인 인재풀을 양성하고, 지연·학연과 계파색을 배제한 공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성균관대 김근세(행정학) 교수는 “대통령이 기존 측근들만 계속 쓰면 매번 똑같은 얘기밖에 들을 수 없어 ‘집단사고(Group Think)’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문재인 전 후보를 지지했던 48%의 유권자들을 포용하기 위해선 ‘이념적 탕평’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2005년 보수정당인 기독민주당을 이끌고 총선에서 승리한 뒤 좌파 성향인 사회민주당과 대연정을 구성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정하·정원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