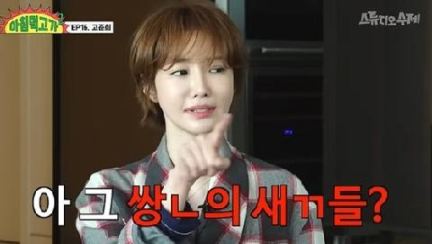올림픽 금메달은 '민족의 영웅' 으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기회다.
손기정옹이 그랬고 1976년 레슬링 자유형의 금메달리스트 양정모가 그랬다.
콜롬비아에서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낸 이사벨 우루티아(35),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첫 금메달을 안긴 '잠베지강의 후예' 마리아 무톨라(28), 라트비아 최초의 금메달리스트 이고르 비로프스(22)는 영원히 조국의 역사에 남는다.
여자 역도 75㎏급에서 1위를 차지한 우루티아는 콜롬비아 의회 상원의원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게 됐고, 포상금도 5만달러(약 5천5백만원)나 챙겼다.
여자 8백m에서 금메달을 따낸 무톨라는 아프리카 육상의 중거리 정복 가능성을 열며 정부와 협회로부터 각종 포상은 물론 남은 여생 동안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살게 됐다.
남자체조 마루운동에서 금메달을 따낸 비로프스는 정부와 소속팀으로 부터 포상금 16만5천달러(약 1억8천만원)를 받게 돼 라트비아 최고의 스포츠 갑부로 떠올랐다.
카자흐스탄 육상 첫 금메달리스트 올가 시시기나(31)는 여자 1백m 허들 우승으로 10만달러(약 1억1천만원)의 거액을 한 순간에 챙겼다.
사격 여자 트랩에서 우승한 리투아니아의 '저격수' 다이아나 구지네비슈테(34)는 무려 40만달러(약 4억4천만원)의 포상금을 약속받아 탄환으로 '잭팟' 을 터뜨린 격이 됐다.
이번에 종합 3위로 떠오른 스포츠 강국 중국은 금메달리스트에게 8만6천위안, 은메달리스트에게 5만위안, 동메달리스트에게 3만위안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8만6천위안(약 1천90만원)은 중국인 1인당 연간 평균소득의 10배가 넘는 거액이다.
48년 런던 올림픽 은메달 이후 52년 만에 조국 스리랑카에 첫 메달(육상 여자 2백m 동메달)을 안긴 수산티카 자야싱헤는 1천만루피(약 1억4천3백만원)의 포상금과 함께 정부 관리와 섹스 스캔들, 금지약물 복용설 등 불명예를 함께 씻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