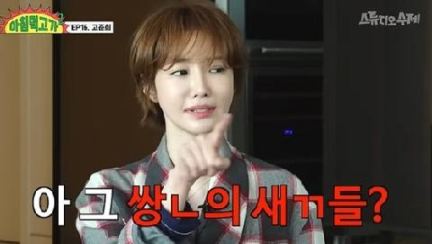이른 아침 시화호의 찬 바람에 정신이 퍼뜩 든다. 푸른 하늘에 하얀 저어새들이 무리 지어 날아오른다. 멀리서도 넓적한 부리가 보인다. 저어새는 주걱 같은 부리를 휘휘 저어가며 먹이를 잡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는 가래질하는 것 같다고 해 가리새(정약전의
시화호 찾는 저어새 매년 늘어, 전 세계 2300마리뿐
저어새는 현재 지구상에 2300여 마리만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구상에 인간이 2300명만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라! 한국에서는 천연기념물 제205호,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동행 취재한 시화호지킴이 최종인(안산시 지구환경과)씨는 “그동안 띄엄띄엄 낱 마리로 보이더니 재작년에 230여 마리, 지난해에는 270여 마리가 찾아왔다”고 귀띔했다. 드넓은 갯벌에서 가래질하던 저어새가 인공 담수호인 시화호로 날아든 사연은 뭘까. 최씨는 시화호 수문 개방 이후 민물·바닷물의 교차로 망둥이 등 먹이가 풍부해진 것과 상류 수심이 저어새들이 먹이 활동하기 좋을 만큼 완만해진 결과로 풀이했다.
저어새는 여름 철새지만 고향은 대한민국이다. 한국물새네트워크 대표 이기섭 박사는 “전 세계 대부분의 저어새가 우리나라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무인도 등지에서 새끼를 키운다”고 말했다.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번식을 마친 저어새들은 월동을 위해 남행길에 나선다. 최근 연구자들이 알아낸 이동 경로는 두 갈래다. 일본 규슈 남부와 오키나와를 거쳐 대만으로 가거나, 중국 남부를 거쳐 홍콩·베트남으로 향한다.
가을 하늘을 둥글게 맴돌던 저어새들이 사뿐 내려앉는가 싶더니 부리를 물에 담근다. 먹이 찾아 고개를 휘두르며 줄지어 나아가는 모습에 웃음이 절로 난다. 잘 먹고 체력을 다지는 일이야말로 먼 길 떠나는 저어새들에게는 생존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멸종 위기에 있는 이들의 생존에 더욱 심각한 일은 갯벌 간척으로 인한 번식지와 먹이터 훼손이다.
인천 남동공단의 폐수를 일시적으로 가둬 놓는 유수지에서 저어새들이 번식했다는 소식은 무얼 의미하는 것일까? 이들이 안전하게 서식할 공간이 없다는 반증이 아닐는지. 그런 만큼 시화호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최씨는 “시화호가 저어새들의 먹이터와 중간기착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푸른 하늘로 사라지는 저어새들의 하얀 날개에 가을 햇살이 눈부시다.
사진·글=안성식 기자 anses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