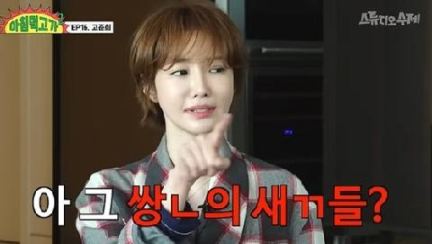관직에 오르는 사람이 깨끗한가를 따질 때 늘 등장하는 게 이 글자다. 그러나 이 글자의 본래 뜻은 일반 건축물인 당실(堂室)의 ‘가장자리’다. 이와 함께 거론하는 글자가 우(隅)다. ‘모퉁이’라는 새김이다. 이 두 글자는 모두 건축물에서 각(角)이 진 곳을 가리킨다. 렴은 측변(側邊), 즉 옆쪽의 벽면을 말한다. 정면에서 바라볼 때 왼쪽과 오른쪽에 각을 세워 만든 벽면이다. 정각(正角)으로 바로 잡혀야 건물이 반듯해짐은 물론이다.
모퉁이를 뜻하는 ‘우’라는 글자는 그 벽들이 만나는 곳이다. 제대로 잡힌 각들이 합쳐지는 곳이기도 하다. 역시 이곳 모퉁이의 각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건물이 제대로 설 수 없다. 따라서 렴의 본래 뜻은 곧고 바른 방정(方正)함을 묻는 기준이다. 나중에 돈과 재물에 욕심을 부리는 ‘탐(貪)’의 반대말로 쓰이면서 부정(不正)한 재물에 욕심을 두지 않는 사람의 품성을 뜻하는 글자로 자리 잡는다.
티끌 하나도 묻히지 않은 사람이 ‘일진불염(一塵不染)’이다. 원래는 세속적인 욕심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을 뜻하는 불가(佛家)의 용어지만, 부정한 재물에 눈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현어(懸魚)’라는 말도 있다. 직접적인 번역은 ‘물고기를 매달다’의 뜻이다. 동한(東漢) 때 양속(羊續)이라는 관리가 자신의 부하들이 보내 온 물고기를 먹지 않고 마당에 걸어둔 데서 나온 말이다. 뇌물을 건네려는 사람들이 이 물고기를 보고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다. 고대 건축에서 실제 물고기 나무 조각을 지붕 밑에 붙여두는데, 이를 지칭하는 용어도 ‘현어’다.
옷소매에 부는 깨끗한 바람이 양수청풍(兩袖淸風)이다. 명(明) 때의 관리 우겸(于謙)의 청렴함을 표현하는 말에서 나왔다. 빈 몸으로 와서 빈 몸으로 돌아가는 깨끗한 관리의 전형(典型)이다.
티끌 하나 묻히지 않고, 제 집 앞에 물고기를 걸어두며, 부정직한 재물로 제 몸에 무게를 보태지 않는 한국의 공직자들이 드문 모양이다. 고위직에 오르는 사람들을 두고 요즘 열리는 청문회를 보면 그렇다는 생각이다.
‘위장전입’은 기본이라고 하니, 청렴결백해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는 뜻의 ‘염치(廉恥)’라는 품목은 이제 사치품 리스트에라도 올려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유광종 중국연구소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