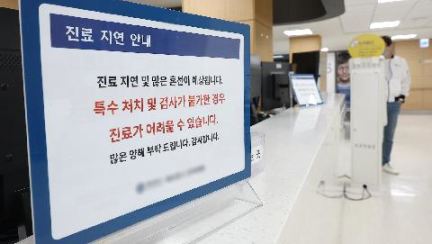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난 3월 국내에 발간된 『섹스 피스톨스 조니 로턴』은 펑크록의 원조 섹스 피스톨스의 궤적과도 같은 책입니다.
이 그룹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으면 읽기 곤혹스러울 만큼 사적인 이야기가 많이 담겨있는데요, 상당 부분이 매니저와 멤버들의 갈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매니저에 대한 험담과 욕설이라고 해야겠네요.
섹스 피스톨스뿐만 아닙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1970년대든 2000년대든, 가수와 매니저, 요즘 흔한 말로 하자면 기획사와의 관계는 언제나 애증이 엇갈립니다.
다른 사례도 물론 있습니다. 록밴드 크라잉넛. 당당한 주류 밴드로 성장한 이 인디 밴드의 성장담은 기가 막힙니다.
없는 돈을 털어 만든 초기 앨범. 유통업자들의 외면 속에 봉고 차량에 CD를 싣고 전국을 돌며 직접 팔았다는 것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밤마다 공연하는 클럽 드럭도, 앨범도 돈이 되지 않은 아득한 상황이 계속되자 결국 멤버들은 '아저씨' 라고 부르는 클럽 주인이자 앨범 제작자 이석문씨와 함께 우유 배달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한푼 두푼 모은 돈으로 빚을 갚고, 새 앨범을 내고, 전국을 돌며 라이브 공연을 계속하고….
밴드란 그런 것입니다. 스스로 곡을 만들고, 연주를 하고, 프로듀싱을 하고, 끊임없이 공연하고, 때로는 서로 싸우고. 무명과 가난의 설움을 딛고 마침내 사람들이 알아주게 되면 다시 인기라는 괴물과 맞서 싸우고. 그 속에서 살아있는 음악이 나오고 뮤지션으로서 자율성과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룹 들국화의 전인권씨. "술먹고 똑바른 소리 하려면 왜 술을 먹니?" 라는 개그맨 전유성씨의 지론을 인용하며 유쾌하게 술잔을 돌리다가도 들국화의 고생담을 이야기할 때면 어느덧 담담해집니다.
'밥값' 도 없던 시절. 가난은 짜증을 낳고 짜증은 다툼을 낳아 그룹은 위기를 맞고. 전씨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음악이 길게 가는데…" 라며 요즘 후배들을 걱정합니다.
물론 시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들국화나 크라잉넛같은 자생적인 밴드보다는 기획사와 프로듀서에 의해 '만들어진' 보이 밴드와 댄스 그룹이 TV의 위세를 등에 업고 쉽게 인기를 얻고 또 쉽게 사라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결국 음악인으로 남기 위해서는 밴드의 자율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문화는 소비자의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god를 비롯한 보이 밴드의 열성팬 여러분. '기획사의 횡포' 를 탓하기 이전에 진정한 밴드란 어떤 것인지,
또 자생력 있는 밴드를 지향하는 이들이 천대받는 작금의 한국 가요계 상황에 혹시 여러분과 저의 책임은 없는지 잠깐이라도 되새겨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최재희 기자
![[오늘의 운세] 6월 1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