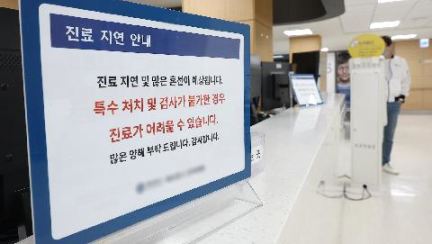‘비둘기파’는 강경론자인 ‘매파’에 대응해 온건론자를 지칭한다. 베트남전에서 ‘주전(主戰)’과 ‘주화(主和)’를 상징하면서 정립된 표현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강압과 대화를 동시에 구사하는 ‘올빼미파’도 있다.
비둘기는 옛날부터 인간 주변에 머물렀다. 길들이지 않아도 머물렀다, 떠났다, 알아서 돌아온다. 이 귀소본능을 이용한 게 전령구(傳令鳩)다. 1835년에 설립된 프랑스 AFP의 전신 아바스(Havas)통신은 한때 벨기에와 영국 뉴스를 ‘비둘기 익스프레스’로 전달받았다고 한다. 동양에서는 춘추전국시대부터 편지를 전하는 전서구(傳書鳩)로 활용됐다.
그러나 이런 비둘기도 급격한 도시화로 몸살을 앓게 된다. 김광섭 시인은 ‘성북동 산에 번지(番地)를 잃어버린 비둘기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찍어 먹을 마당조차 없다’며 자연 파괴와 인간성 상실을 안타까워했다. 한데 구공탄 굴뚝 연기의 향수마저 사라진 지금, 축복의 메시지는커녕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돼 포획대상이 됐다. 쓰레기통을 뒤져 살이 찌면서 ‘닭둘기’란 별명까지 얻었다. 그야말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캐나다의 강과 호수엔 ‘야생 오리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란 경고판이 있다. 이유는 겨울에 굶어죽기 때문이란다. 봄철 관광객들이 몰려와 먹이를 주는 바람에 새끼오리가 물고기 사냥술을 익히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겨울에는 관광객이 오지 않고, 따라서 자립능력을 키우지 못한 오리가 굶어죽는다는 얘기다. 비둘기의 경우도 인간들이 얄팍한 적선으로 야생본능을 빼앗고는 이제 볼썽사납다고 딴청인 것은 아닌가.
시용향악보에 유구곡(維鳩曲)이 있다. ‘비둘기는 울음을 울되 뻐꾸기가 난 좋아’란 내용이다. 고려 예종(睿宗)의 벌곡조(伐谷鳥) 일부라고도 한다. 여기서 비둘기는 겁이 많아 임금의 잘못을 말하지 못하는 신하, 뻐꾸기는 잘잘못을 직언하는 신하를 비유했다. 예종은 뻐꾸기를 고대했지만, 지금은 어떤가. 포획해야 할 ‘닭둘기’가 거리에만 있나.
박종권 논설위원
![[오늘의 운세] 6월 1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