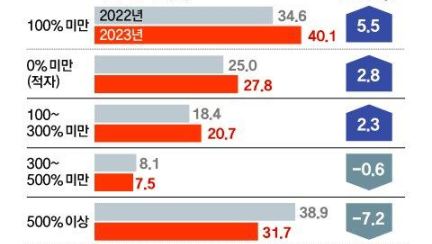21. 들쥐와의 싸움
일본뇌염이 모기와의 싸움이라면 유행성 출혈열은 들쥐와의 싸움이었다. 유행지역이 들쥐의 집단 서식처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유행성 출혈열도 들쥐에서 비롯되는 질환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본격적인 들쥐사냥에 나섰다. 들쥐 사냥꾼은 65년부터 연구팀의 일원으로 나와 인연을 맺은 김수암씨였다.
그는 들쥐는 물론 모기와 박쥐, 뱀까지 실험에 필요한 야생동물의 생포를 도맡아온 베테랑이었다.
지금도 녹십자 목암연구소에서 35년째 나와 같이 일하고 있는 김씨에겐 두가지 에피소드가 있다.
한번은 경기도 연천에 들쥐를 잡으러 나갔던 그가 사색이 되어 연구실로 돌아와 다시는 들쥐사냥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가.
군부대 근처에서 들쥐를 채집하다 간첩으로 오인되어 하마터면 순찰 중인 군인에게 사살당할 뻔 했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발포 직전 경비병에게 체포되어 포박당한 뒤 사령부까지 끌려왔다 겨우 풀려난 것이다. 야행성 동물인 들쥐의 채집은 밤에 이뤄지므로 미리 군대에 신고하고 작업을 하는데 그날따라 경비병의 실수로 다음번 교대근무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이었다.
당시가 어떤 때인가. 남북이 군사적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던 초긴장상태가 아니었던가.
자정 이후 통행금지가 있던 시대에 그것도 휴전선 군부대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이 쥐를 잡느라 손전등을 깜박거리고 다녔으니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기 짝이 없다. 총탄세례를 받아도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부터 김씨는 군부대를 피해 민간인 거주지역만 뒤지며 쥐를 잡기 시작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은 포천에서, 또 한번은 성남에서 각각 간첩으로 오인돼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위기는 따로 있었다. 출혈열 연구를 시작한지 1년 반이 지난 1971년 6월 들쥐채집을 나갔던 김수암씨가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 서울로 돌아온 것이다.
당시 28세로 마른 편이었지만 건강했던 김씨는 의정부 낙양동 근처 출혈열 유행지역에서 들쥐를 잡다 처음 증상이 나타났다. 갑자기 오한이 생기고 고열과 두통이 생겨 감기몸살인줄 알고 아스피린을 복용했다.
그러나 열이 떨어지지 않고 설사가 계속되었다. 성실한 김씨는 아픈 몸을 이끌고도 발병 사흘째 날까지 쥐를 잡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악화된 다음이라야 서울로 돌아온 것이다.
서울에서 내가 그를 진찰해보니 눈의 결막이 충혈되있고 체온도 40도를 웃돌았다. 요통이 심했는데 소변은 나오지 않았다.
수상하다싶어 발병 6일째 되는 날 그를 국군 유행성 출혈열 연구센터가 있는 창동 57 후송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그랬더니 진찰 결과 우려한 대로 유행성 출혈열로 판명됐다. 병원에 입원한지 이틀후 서울대의대의 내 연구실에 노부부가 찾아왔다. 김씨의 부모였다.
내 연구를 돕다 아들이 사경에 빠졌으니 답답한 심정이야 오죽했으랴 싶었다. 나도 변명이나 대꾸는 하지 않았다.
우수한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있으니 걱정 마시라며 위로했으나 속내는 이 병이 10%에 가까운 사망율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터라 몹시 걱정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엔 연구원들이 들고 일어났다. 연구원 5명중 3명이 이처럼 위험한 연구는 할 수 없으니 그만 두겠다는 것이 아닌가.
김씨는 점점 상태가 나빠져 쇼크에 빠진채 일주일간 사경을 헤매야했다. 콩팥이 망가져 혈액을 복막세척이란 응급처치로 걸러내기까지했다.
하는 수 없이 나는 일단 연구실 문을 닫기로 했다. 그리고 김씨가 완쾌하길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호왕 <학술원 회장>
정리=홍혜걸 의학전문기자
![[오늘의 운세] 6월 1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