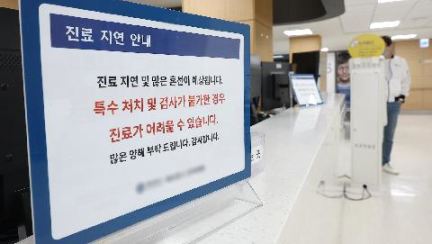한국과 중국 양국이 24일로 수교 5주년을 맞는다.
양국관계의 최근 발전속도는 과거 오랜 역사적 교류를 감안하더라도 말 그대로 괄목상대 (刮目相對) 하다.
특히 경제적.인적 교류의 증대는 폭발적이라고 할 만하다.
이제 양국은 서로가 '없어선 안될 상대' 가 된 것이다.
중국은 여전히 안보상 이유로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가 약화되길 원치 않는 입장이지만 한편으론 언제 붕괴할지 모르는 북한을 얼마나 더 붙들고 있어야 할지 고민도 하고 있다.
편집자
현재의 한국과 중국 양국관계는 "동서고금 (東西古今)에서 가장 빠른 시일안에 가장 급속한 성장을 이룬 사례" 로 평가된다.
숫자상으로만 보더라도 양국 정상은 지난 5년동안 6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노태우 (盧泰愚).김영삼 (金泳三) 대통령과 장쩌민 (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이 상호 방문했는가 하면 아태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담에서 별도의 정상회담도 벌였다.
인적 교류 역시 수교당시 9만명선에서 지난해 64만명으로 늘어났고 전국 14개 광역시.도와 50개 시.군.구가 중국의 성 (省).시와 자매결연을 통해 활발하게 교류중이다.
무역협정.투자보장협정등 26개의 협정도 체결돼 급속한 관계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현재 협상중인 어업협정과 배타적경제수역 (EEZ) 협정을 제외하면 중요한 협정은 대부분 마무리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양국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처럼 획기적인 관계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이유를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동질감, 과거 2천년간의 교류역사등 한.중관계의 특수성에서 찾고 있다.
양국 외무부관리들은 이를 두고 "한.중관계는 5년이 아닌 2천5년간의 역사를 갖고 있다" 고 표현한다.
최근 방한 (訪韓) 한 중국 외교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서울에서 경복궁.성균관을 둘러보고 지도층 인사들과 필담 (筆談) 을 나눠보니 평양과 달리 '문화적 동질감' 을 느낄 수 있었다" 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양국이 상대국과의 경협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점은 비약적 관계발전을 자극하는 중심적 요인이 됐다.
그러나 이같은 외형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치.안보관계는 아직도 초보적 수준이며 기대에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북한을 중국안보의 완충지대로 유지한다" 는 중국의 '한반도 현상유지론' 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안보동맹유지나 북한에 대한 군사.경제지원도 이같은 맥락에서 설명된다.
중국은 매년 50만의 식량을 2000년까지 북한에 제공키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중국은 북한 주재대사는 차관급을, 한국주재대사는 국장급을 파견하고 있다.
그러나 한.중간 정치.안보관계는 장기적으로 '호의적 중립관계' 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낙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 당시 중국이 유엔안보리의장 대북경고성명에 참여한 것은 이같은 움직임의 신호탄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한다.
그리고 이는 중국의 황장엽 (黃長燁) 씨 망명사건처리나 대만핵 문제에 대한 반대방침에서도 재확인된 바 있다.
외교안보연구원 박두복 (朴斗福) 교수는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는 미.중 안보갈등과 이에따른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가치인정으로 요약된다" 고 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극 개입정책과 북한의 대미관계개선 움직임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후견자' 를 자처한 중국의 전통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중국은 당분간 북한과의 '안보유대' 를 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미 관계개선은 물론, 북한의 급속한 붕괴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중국으로서는 비경제영역에서의 한.중관계 발전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상연 기자
![[오늘의 운세] 6월 1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