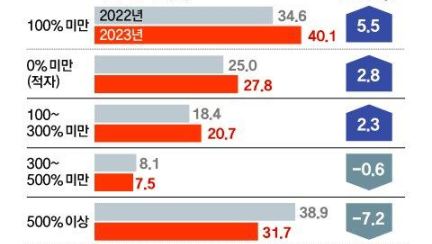대한항공 801편 참사로 가족을 잃고 괌을 찾은 유가족들은 '현장' 에서 또 다른 고통을 맛봐야 했다.
사고처리를 둘러싸고 드러나는 한.미간의 현격한 인식차에 따른 속끓임들이다.
유가족과 미당국간의 '삐걱거림' 은 지난 7일 오전3시쯤 유가족들이 탄 대한항공 특별기가 괌에 도착하면서 비롯됐다.
유가족들은 즉시 현장에 가보길 원했다.
그러나 미당국측의 불허방침은 미동도 안했다.
이날 새벽 유가족들이 머무를 예정이었던 호텔 로비는 '예상대로' 이들의 항의와 고함및 욕설등으로 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7일 오전 이후부터 매일 진행되고 있는 사고현장 방문도 유가족들에겐 성에차지 않는 것이었다.
첫날과 달리 조금씩 접근이 되고는 있지만 시신이나마 부둥켜안고 싶어하는 우리네 '정서' 는 늘 완강한 미군측의 제지에 눌려 언저리만 맴도는 것으로 삭여져야 했다.
유가족들의 절규는 "우선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뒤늦게 무슨 조사냐" 로 압축되고 있다.
또 사고처리나 사후 수습이 "너무 질질 늘어진다" 며 격앙돼 있다.
이래저래 퍼시픽 스타 호텔 지하에 자리한 유가족 합동분향소는 고성이 잦아질 틈이 없다.
9일 낮에는 이환균 (李桓均) 건설교통부장관과 조양호 (趙亮鎬) 대한항공사장이 분향을 위해 이곳을 찾았다가 욕설과 몸싸움 끝에 간신히 벗어나는 봉변을 당하기까지 했다.
반면 미국인들은 곳곳에서 다른 시각들이다.
사고수습을 책임지고 있는 미 당국자들은 "사고원인 규명이 가장 시급한 과제" 라고 강조하고 있다.
"현장보존을 위해 유가족들의 근접방문은 규제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냐" 며 고개를 젓는다.
생존자들에 대한 면회도 "환자의 회복.안정이 더 중요하므로 산 사람은 참아야 한다" 는 식이다.
자주 핏대를 올리는 '우리' 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원칙대로만 대처하는 '저들' 이 부닥치는 모습을 지켜보노라면 답답함만 남는다.
이제 부상자들은 떠나고 시신확인등 마무리단계에 들어가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절차는 산적해 있다.
'가슴' 과 '머리' 중 어느쪽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지 차분히 생각해 볼 때다.
김용일 기자=괌 특별취재단
![[오늘의 운세] 6월 1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