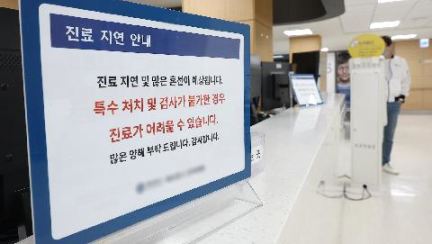지금 자영업만큼 경제 한파의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있는 경제부문도 없다. 퇴출 쓰나미에 밀려 벼랑끝에 서 있다. 경제위기를 맞아 정부는 경기부양, 기업 구조조정, 신용경색 완화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녹색성장, 미래 성장동력 같은 거창한 청사진 속에서 자영업은 찾을 수 없다. 대부분의 정책이 법인 기업과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영업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 취업자의 약 30%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도 말이다. 자영업의 몰락은 임금 근로자의 실직과는 차원이 다르다. 가게 문을 닫으면 온 가족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다. 이런 점에서 자영업의 붕괴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물론 자영업 가구의 재무건전성은 임금 근로자 가구에 비해 취약하다. 따라서 퍼주기식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3배 정도 높다. 일본의 자영업자 비중은 10%가 채 안 된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탈공업화 속도가 너무 빨라 제조업의 취업기회가 급속하게 감소한 점이다. 일본에서는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정점(1973년 26.2%)에 달한 후 20% 이하로 떨어지는 데 25년(98년 19.4%)이 소요된 반면 우리는 단 9년(89년 29%, 98년 19.7%)이다. 외환위기와 명예퇴직 등으로 제조업의 취업기회가 빠르게 사라진 것이다. 두 번째는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지체됐다는 점이다. 서비스 산업에서 임금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제약된 것이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서비스업 비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67% 정도로 구미 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기준) 평균인 78%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세 번째는 선진국에 비해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해 생계 유지를 위해 창업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 자영업은 제조업에서 퇴출된 잉여노동을 수동적으로 흡수하는 고용 안전판에 불과한 것일까. 흔히 자영업 하면 소매업이나 음식업에 종사하는 고령자 위주의 생계유지형 상점을 떠올리기 십상이다. 실제로 최근까지도 도소매·음식·숙박업이 자영업의 주종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보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우리의 자영업 부문에도 발전적 요소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외환위기 이후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 자영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운수·통신·금융·공공서비스 등 성장성 높은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수는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따라서 자영업에 대한 지원은 세분화돼야 할 시점이다. 무차별적 지원보다 정교한 지원이 필요하다. 자영업 지원대책도 사회보장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성장동력 확충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전통적 업종의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퇴출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해서는 우선 사회안전망 강화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직업훈련시스템 확충을 통해 이들이 성장산업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새로운 대책이 요구되는 분야는 성장성이 높은 지식기반의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은 젊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만큼 미래 성장동력으로도 손색이 없다. 이들에게 경제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금융기관 접근성 제고와 긴급자금 지원 등의 정책 모색이 시급하다. 자영업은 우리 경제생태계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다. 자영업 몰락을 방치하고는 건강한 경제시스템을 기대할 수 없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굴지의 기업도 모두 허름한 지하실의 자영업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김현정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오늘의 운세] 6월 1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