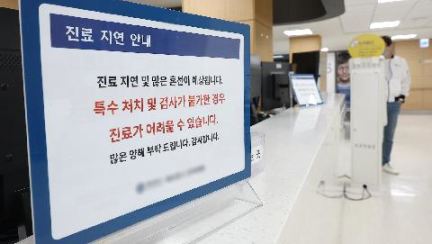누구에게나 추억은 있다.그것은 싫든 좋든 사람의 마음속에.애증의 그림자'로 자리잡는다.특히 암울했던 과거는 떠올리기조차 싫은 기억으로 오랫동안 남는다.일제 36년의 망령은 해방후 50여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다. 경북의 오지인 봉화읍에서도 40여리 떨어진 춘양역.40년된 역사(驛舍)에는 두 그루의 향나무와 전나무.낙엽송만이 외롭게 서있다.전형적인 산촌의 고즈넉한 분위기가 역사를 감싸고 돈다. 주말이 돼야 집을 찾아오는 학생들로 붐빌 뿐 평일에는 이용객이 거의 없어 한산하다.그래도 태백산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을 타고 열차가 가쁜 숨을 내쉬며 서서히 들어오면 머리에는 보따리,양손에는 무거운 짐을 든 시골 아낙네들의 발 걸음이 분주해진다. 춘양역이 생겨나기전 춘양(경북봉화군춘양면)은 적송의 집산지였다.전국의 목재상들이 모여들었다.붉은 빛이 돌아 적송으로 불리는 춘양목은 터지거나 비틀림이 없고 가벼우며 벌레가 안먹는다.또 잘 썩지도 않아 예부터 한옥을 짓는데 으뜸으 로 쳤다.흔히 볾자꼴로 이뤄진 안동의 세도가나 서울의 번듯한 집은 한결같이 춘양목을 사용해 지은 고옥들이다. 봉화군내 1천가 넘는 산에는 1930년대까지도 춘양목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다.그러나 40,50년대에 걸쳐 깡그리 잘렸으며지금은 왕피리(경북울진군서면)에서 조금씩 생산될 뿐이다. “쇼와(昭和)15년(1941)부터 왜놈들이 구마동(봉화군소천면)과 대현(봉화군석포면)에서 1백자(약 30)가 넘는 나무들을 숱하게 베어갔지.그나마 조금 남았던 나무들도 6.25사변뒤혼란기를 틈타 군용화물차로 마구 실어내는 바람에 이제는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됐어.” 젊은 시절 벌목공이었던 손석진(孫錫秦.71)할아버지.내뿜는 담배연기 사이로 비치는 주름살에는 살아온역정이 깊이 새겨져 있다. 춘양목은 심산유곡 추운 곳에서 잘 자라는 육송(陸松)의 한종류.태백산(강원도태백시.1천5백67).일월산(경북영양군.1천2백19).소백산(충북단양군.1천4백40)등이 주요 생산지였다.길이 험해 나무를 육로로 수송할 수 없던 옛날엔 낙동강에 뗏목을 띄워 안동으로 보냈다.그러나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은 춘양으로 몰려들었다.상권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다보니 50년대말까지도경기가 좋았다. “좁은 마을에 1백개가 넘는 술집들이 밤이면 불야성을 이뤘지.육자배기 소리는 끊이질 않았고 밤늦게 멱살을 잡고 다투는 일도 허다했어.지금과 비교하면 왁자지껄한 것이 사람사는 것 같았지.” 50년대말 춘양면의 인구는 1만3천여명.지금(약 7천명)의 2배 규모였다.특히 제재소는 수십개를 헤아릴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孫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삼창제재소만 유일하게 명맥을 잇고 있을 뿐이다. 봉화에 처음 철길이 놓인 것은 제2차세계대전 말기.중석(텅스텐)광산인 옥방광업소에서 채탄된 광석은 전략물자로 사용됐다.일제는 군대까지 주둔시키면서 해마다 수백씩 캐냈고 이를 실어나르기 위해 영주~춘양을 잇는 철도공사가 시작됐다.4 5년 봉화읍까지 철길이 뚫렸으나 해방으로 중단됐으며 45년8월23일 쏟아진 폭우로 유실됐다. 49년 복구돼 봉화까지 기차가 들어왔고 춘양까지 잇는 철도공사가 재개됐다.그러나 6.25로 다시 중단됐으며 봉화~춘양~철암으로 이어지는 영암선(지금의 영동선)이 56년7월1일 완공됐다.영주~철암구간을 잇는 이 철길은 해방후 우리의 기술로 맨처음 놓여진 것이다. 한때 전국의 내로라하는 목재상들의 발길이 이어졌던 춘양.지난60,70년대 국가의 대동맥 역할을 해왔던 영동선이 거쳐가는 춘양역.산모퉁이를 돌아가는 열차의 뒷모습처럼 이곳도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가고 있다. <춘양=김세준 기자> 경북봉화군춘양면은 춘양목의 집산지로 유명한 곳이다.춘양역은 국내 최초로 우리의 기술로 건설된 영동선이 지나간다.승객들이 열차를 타기 위해 춘양역 구내로 들어오고있다.
<추억으로가는간이역>13.경북 봉화군 춘양역
중앙일보 지면보기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최근 1개월 내
지면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지면보기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면 최신호의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더중앙플러스 회원이 되시면 창간호부터 전체 지면보기와 지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더중앙플러스 회원이 되시겠습니까?
더중앙플러스 회원이 되시겠습니까?
앱에서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
- · 로그인하면 AD Free! 뉴스를 광고없이 더 깔끔하게
- · 속보는 물론 구독한 최신 콘텐트까지! 알림을 더 빠르게
- · 나에게 딱 맞는 앱 경험! 맞춤 환경으로 더 편리하게

2024년 최고의 시계를 발견해가는 여정
Posted by 더 하이엔드

개성과 품격 모두 잡은 2024년 하이패션 트렌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집앞까지 찾아오는 특별한 공병 수거 방법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로맨틱한 연말을 위한 최고의 선물
Posted by 더 하이엔드

데이터로 만들어낼 수 있는 혁신들
Posted by 더존비즈온

희귀질환 아이들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ILab Original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메모
0/500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추억의 뽑기 이벤트에도 참여해보세요. 이벤트 참여하기
추억의 뽑기 이벤트에도 참여해보세요. 이벤트 참여하기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추억의 뽑기 이벤트에도 참여해보세요. 이벤트 참여하기
추억의 뽑기 이벤트에도 참여해보세요. 이벤트 참여하기
더중앙플러스 구독하고
추억의 뽑기 이벤트에도 참여해보세요. 혜택가로 구독하기
추억의 뽑기 이벤트에도 참여해보세요. 혜택가로 구독하기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 회원이 되시면 다양한 편의 기능과 함께 중앙일보만의 콘텐트를 즐길수 있어요!
- 취향저격한 구독 상품을 한눈에 모아보고 알림받는 내구독
- 북마크한 콘텐트와 내활동을 아카이빙하는 보관함
- 기억하고 싶은 문구를 스크랩하고 기록하는 하이라이트/메모
- 중앙일보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스페셜 콘텐트
알림 레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뉴스레터 수신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하시겠어요?
뉴스레터 수신 동의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 6월 1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