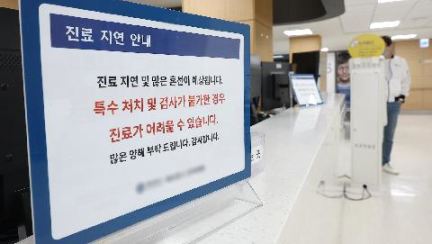베르너 지퍼 외 지음,
전은경 옮김,
들녘,
423쪽, 1만3000원
나는 무엇인가. 스님의 참선 화두도, 사춘기 청소년의 고민도 아니다. 이 심오한 물음은 이젠 과학의 연구 과제다. 독일 잡지 ‘포쿠스’의 과학·기술 담당인 지은이들은 종교적 몰입이나 철학적 성찰 대신 정신의학, 뇌과학, 인지과학을 활용해 해답을 구하러 나선다. 이들은 우리의 두개골 아래에 그 답이 숨어있다고 본다. 뇌 말이다.
사례를 하나 보자. 전과자에 마약 중독자였던 51세의 건축노동자 토미 맥휴는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공격적인 성격이 사라지고,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로 변신한 것이다. 토미에게 어떤 게 진짜 ‘나’일까?
32세의 우도 데더링은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사고 전 다발성 경화증으로 휠체어 신세를 졌던 그는 6주 뒤 혼수상태에서 깨어난 뒤 멀쩡하게 걸어다니게 됐다. 대신 그는 모든 기억을 상실했다. 우도에게 ‘나’는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
뇌의 변화가 사람 자체를 바꾼 경우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일을 드물지 않다. 스위스의 어떤 기자는 뇌 손상을 입은 뒤 맛 감각이 지극히 예민해졌다. 그래서 맛집 평가팀으로 자리를 옮겨 이름을 날리고 있다. 뇌의 변화가 입맛을 바꿔놓은 것이다. 취리히 대학의 마리안네 레가르드 교수는 수많은 동일 사례를 발견하고 ‘식도락 증후군’으로 이름 붙였다.
독일 마인츠 대학의 의식전문가인 토마스 메칭어는 “‘나’라는 것이 선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깨지기 쉬운 구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 그 근거의 하나가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는 ‘나로부터의 이탈’ 증후군이다. 어릴 때 성폭행을 비롯한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의 일부는 피해자가 자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는 환상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인식 속에서 여러 개의 자아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나’라는 게 마음대로 한두 개 더 만들거나, 3인칭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뜻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도대체 진짜 나는 누구인가. 그런 게 있기라도 한 건가. 메칭어 교수는 “뇌란 몸의 감각기구를 통해 얻은 정보를 처리하는 하나의 정보처리체계”라며 “‘나’란 이러한 뇌가 만들어낸 하나의 허상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적어도 과학적으론 말이다. 부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채인택 기자
![[오늘의 운세] 6월 1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속보] 검찰, 이재명 추가 기소…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2/d6e8bbf8-3a6a-47a3-8d3c-4bfc168b4c42.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