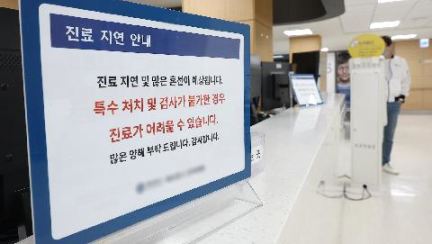뜻밖의 일로 들리겠지만 조선시대의 부부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칠거지악(七去之惡)’으로 여자들이 쉽게 쫓겨났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칠거지악으로 부인이 쫓겨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칠거지악의 악조건들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했기 때문이다. 가령 아들을 낳지 못했을 경우 조선사회가 마련한 양자 제도라는 대안을 이용했다. 사실상 이혼이 불가능했다. 조선의 부부들은 어차피 갈라설 수 없었으므로 상황에 적응하고자 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다. 우선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 조선은 사회 운영의 상당 부분을 가족에게 일임했다. 가족의 안정은 당시 사회의 절대적 과제였다. 국가는 그 핵심인 부부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이유에서든 이혼을 원치 않았다.
혼인이 개인 의지가 아니라 집안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조선의 부부를 심한 갈등 관계에 빠지지 않게 했다. 부모는 충분히 숙고한 끝에 환경이 비슷한 사람과 혼인을 맺어 주었다. 그만큼 부부는 문화적 배경이 유사했다. 부부가 근대 이후에서처럼 개인적인 감정 대립으로 갈등하는 경우는 적었다.
부부라고 해도 동거 비율이 매우 낮았던 점 또한 부부 갈등의 첨예화를 막는 데 한몫했다. 조선은 중기까지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이라는 혼인 형태를 지녔다. 장가를 든 남자가 오랫동안 처가와 본가를 오가며 살았다. 이 기간 동안 부부는 가끔 만났다. 바람 피우지 않는 부부가 오랜만에 합방하면 그 관계가 어찌 애틋하지 않을까.
실제 『미암일기(眉巖日記)』의 저자로 유명한 유희춘(柳希春ㆍ1513~77)과 여성 문인 송덕봉(宋德峯) 부부는 40년간 함께 늙었으나 동거 기간은 20년 미만이었다. 남편의 유배 생활과 외직(外職)파견 때문이었다. 그는 첩까지 두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들 부부는 “만년에 태평함을 누리고 금실이 더욱 좋아진다”고 자평했다.
한 지붕 아래에서 ‘따로 또 같이’ 사는 공간적 분리도 의미 있다. 오늘날처럼 부부가 한 방을 쓰는 문화는 그리 오래된 게 아니다. 조선시대 양반집은 으레 안방과 사랑방이 구분돼 있었다. 이 같은 공간적 분리는 어찌 보면 부부 사이의 소원함을 초래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서로 ‘쿨’ 하게 존중감을 유지하면서 불편하지 않은 관계를 만드는 데에는 유용했다.
부부의 역할이 잘 분담되어 있었던 것도 원만한 부부 관계의 윤활유였다. “남자는 집안의 일을 말하지 아니하고 여자는 밖의 일을 말하지 아니한다”는 『예기(禮記)』 내칙은 권한 분담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효과가 있었다. 부부는 각자의 영역에서 책임을 다함으로써 둘 사이의 갈등 소지를 줄였다.
이런저런 이유로 조선의 부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덜한 갈등 속에서 살았다. 주어진 조건과 환경은 나빴으나 조선의 부부들이 ‘자신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잘 활용한 덕분이다. 그들은 국가가 부부 관계의 갈등과 파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적응했던 것이다.
물론 오늘날의 부부는 조선과는 전혀 다른 여건 아래에 있다. 조선의 방식이 지금도 유효할 이치는 없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익하게 만들어간 조선 부부들의 노력만큼은 크게 참고할 만하다. 부부 사이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의 관계란 바느질과 달라서 쉽게 맺고 끊을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순구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오늘의 운세] 6월 1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