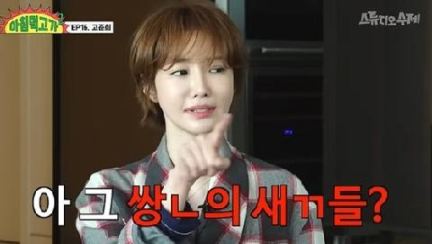5월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노무현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이다. 그날 대통령은 아쉬움이 많았다. 벌여 놓은 일, 못 다한 일이 아직 많지만 하루하루 다가오는 임기 말이 못내 부담스러운 듯 "단임제 임기 말에 김이 빠지고, 동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무산된 중임제 개헌을 아쉬워하고, 정치권의 비협조를 원망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그런 단임제 임기 말의 어려움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막아 주고 있다면서 "정부 내부에 레임덕은 없는 것 같다"고 평가한 것이다.
과연 그럴까. 단임제의 한계나 아쉬움을 인정하더라도 대통령의 이 같은 평가에 선뜻 동의할 수 있을까. 이번 주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만 들여다봐도 대답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17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을 받던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뻔히 보고 있는 가운데 굴절 사다리차에서 떨어져 숨졌다. 행사를 주관한 소방 당국이 안전 교육과 장비 점검을 소홀히 해서 벌어진 사고였다는 점에서 정부가 저지른 범죄 행위나 마찬가지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관청의 수장이 참석한 왕릉 행사장에서 가스 버너에 숯불까지 피워 버젓이 요리를 해 먹은 일도 있었다.
더 고약한 사례는 공기업, 공공기관 감사들의 외유성 남미 출장 파문이다. 이 정권의 캐치프레이즈인 '혁신' 세미나를 내세워 남미로 떠난 21명의 감사들은 이과수 폭포 관광 등의 일정이 본지에 특종 보도된 이후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자 결국 중도 귀국하고 말았다. 여론은 1인당 여행 경비 800만원을 공금으로 받아 외유를 떠난 감사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분노했고, 아무리 봐도 혁신과는 거리가 먼 출장이 정부 안에서 아무런 제지 없이 실행됐다는 점에 실망했다. 해당 감사들이 대부분 노무현 정권 출범 과정에 기여하거나 여당 후보로 각급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는 정치권 출신 인사들이라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김대중 정부의 초대 청와대 부속실장을 거쳐 교육부 차관보를 역임한 고재방 광주대 교수는 6개월 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레임덕 현상은 관료 사회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권력의 생리를 누구보다 생생하게 경험한 고 교수는 레임덕 징후가 공직 인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임기 말이 되면 '끗발 있는 자리'보다 '임기가 보장되는 자리'를 놓고 쟁탈전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설사 정권이 바뀌더라도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출신들은 청와대나 중앙 부처의 요직보다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기업의 임기직 자리를 노리고 줄을 댄다. 책임은 작은 대신 권한이나 연봉은 짱짱한 감사직이 최고의 목표다. 중앙 부처 고위직 공무원들 역시 부처 내 요직이나 승진을 마다하고 공기업이나 해외 근무를 선호하게 된다.
공무원이나 공직자들이 정권 말기라고 모두 일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는 물론 아니다. 그러나 고 교수가 지난 정권에서 목격한 레임덕의 어두운 그림자는 이번 정부에서도 유사하게 되풀이되고 있는 양상이다. 올 들어 적지 않은 고위 관리들이 정부를 떠나 공기업이나 산하 기관으로 옮겼다. 이번 주 남미로 떠났던 감사들 상당수는 지난해 이후 치열한 경쟁을 거쳐 감사 자리에 입성한 인사들이다.
문제는 이런 레임덕 현상의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이다. 공무원의 기강 해이는 각종 비리나 안전 사고로 이어지고, 공직자들의 모럴 해저드는 업무 비효율과 세금 낭비를 가져온다. 고재방 교수는 지난 정권의 사례를 들어 "레임덕이 시작됐는데도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만 실감을 못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공기업 감사들의 남미 출장으로 여론이 들끓기 시작한 후 사흘이 지난 17일에야 '엄정 조사'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은 아직도 "정부 안에 레임덕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일까.
손병수 경제부문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