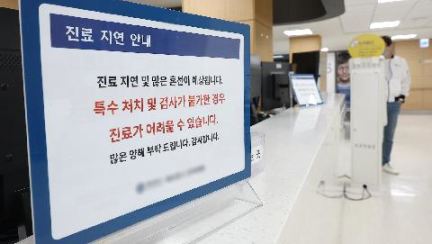◎풀기자제·전황보도 통제 싸고/군·언론 대결 “팽팽”/“적국에 유리”“언론도 국익안다” 불붙어
「국가안보와 언론자유」. 가끔은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를 긴장관계로 몰고 가기도 했던 이 이슈가 이라크전쟁을 계기로 미국에서 또다시 큰 논쟁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전쟁초기 국방부와 군의 엄격한 보도통제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이 논쟁은 전쟁이 진행되면서 군당국의 초기공습성과 번복,CNN의 이라크에 의한 선전도구이용 논란까지 겹쳐 전쟁만큼이나 뜨겁게 가열되고 있다.
논쟁의 발단은 국방부가 전쟁이 시작되면서 전황보도를 엄격히 통제한 것이다.
국방부는 전황발표를 워싱턴의 국방부와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사령부에 국한시키고 전투취재는 풀기자제를 도입,이들이 취재해 현지 군검열을 거친 것만 보도토록 하고 있다.
6백명의 사우디아라비아 특파 미국기자들은 6명씩 조를 지어 취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지 기자들과 미 언론들은 이것이 언론통제로 미 헌법이 금한 「검열」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풀기사가 검열을 거쳤을 뿐 아니라 무엇을,누구로부터,어떻게 취재할 것인지마저 군에 의해 사전계획되자 이같은 보도는 『군의 홍보이지 저널리즘이 아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방부는 이 제도가 전시에 기자들의 ▲이동편의 ▲안전 ▲연합군의 작전보호를 위한 것일 뿐 언론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군과 언론관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또다른 요인은 군이 발표한 연합군의 전과와 전황설명에 대한 신뢰문제다.
미언론은 미군의 첫 공습후 『전략목표의 80%를 파괴했다』고 발표한 다음날 이라크의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 있자 이에 즉각 의문을 제기했고 미군은 결국 이 숫자가 『출격전투기들의 목표물에 대한 성공적인 포탄투하율』을 의미한다고 번복했다.
언론은 그후에도 전과발표가 신속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며 연합군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들어 여전히 군이 전과를 과장하거나 국민에게 알릴 정보를 감추고 있다고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
이같은 인식은 막스 프랭켈 뉴욕 타임스 편집국장의 『전쟁의 규모를 파악할 정보를 못얻고 있다』거나 데이비드 거간 유에스뉴스 앤드 월드리포트지 편집국장의 『언론도 국가안보를 판단할 수 있는데 보도가 적을수록 좋다는 인식이 군을 지배하고 있다』는 불평에서 나타난다.
이에 대해 피터 윌리엄 미 국방부대변인등 군은 『적의 피해를 정확히 파악키 어렵고 너무 자세한 보도는 적을 이롭게 할 수 있다』며 일부 군사기밀의 유지필요성을 역설했다.
걸프전쟁으로 71년 국방부 기밀문서 사건이래 미 언론과 국민에게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이번 국가안보와 언론자유논쟁은 베트남전에서 군과 언론이 얻은 중요한 교훈 때문이란 것이 언론학자들의 분석이다.
미국이 엄청난 인명희생(사망 5만4천명)과 돈(1천6백70억달러)을 투입하고도 역사상 유일하게 패한 베트남전쟁에서 군과 언론은 서로를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의 교훈을 얻었다는 것이다.
베트남전 패배를 치욕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부와 군은 이 전쟁에서 어느전쟁보다 취재자유를 누린 언론의 부정적 보도때문에 패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미언론이 전쟁의 잔인하고 어두운 면만을 과장보도해 미국인의 전쟁사기를 위축시키고 자신의 군대에 등을 돌리게 했다는 것이다.
군은 또 베트남전 결과 모든 언론이 어떤 정보가 국가안보와 아군안전에 해가 되는지 판단할 능력을 갖고 있는가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현지 지휘관들이 처음부터 전쟁전망과 상황을 장미빛으로만 칠해 미국정부와 언론·국민들을 오도,「잘못된 전쟁」을 한데 패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군과 언론이 서로 비판하면서도 국익을 위해서는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 대변인등 군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다룬 TV토론에 나와 비판받으면서도 국민을 설득시키려는 진지한 모습을 보인 것도 인상적이다.<뉴욕=박준영특파원>
![[오늘의 운세] 6월 1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