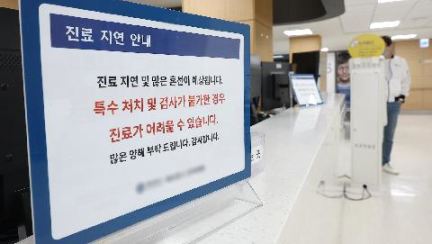골키퍼 이운재가 박지성의 동점골이 터지는 순간 환호하고 있다. [라이프치히 로이터=연합뉴스]
라이프치히 첸트랄 경기장은 전쟁터였다. 한국전에 자존심을 건 '뢰블레 군단'의 초반 집중 포화는 무서웠다. 이운재는 90분 내내 쏟아진 포탄을 온몸으로 끌어안았다.
첫 번째 포탄은 전반 6분 날아왔다. 티에리 앙리의 패스가 우측에서 파고들던 실뱅 윌토르에게 정확히 연결됐지만 슛을 날렸을 때는 이미 이운재가 길목을 차단한 뒤였다. 그의 '투혼'에 행운의 여신도 손을 들었다.
전반 31분 오른쪽 무릎 밑을 파고드는 파트리크 비에라의 송곳 같은 헤딩슛을 이운재는 동물적 감각으로 쳐냈다. 박지성의 동점골로 1-1이 된 상황에서 후반 42분 프랑스의 최후의 반격. 지단의 킬 패스가 다시 앙리에게 연결됐다. 첫 번째 골은 허용했지만 이번엔 이운재가 빨랐다. 방향을 교묘히 꺾은 앙리의 슛은 공간을 좁혀들며 몸을 날린 거미손에 걸렸다. 튕겨 나온 공을 그는 재빨리 몸을 일으켜 끌어안았고, 골잡이 앙리는 그라운드에 주저앉았다. 경기 전 "손으로 안 되면 온몸으로 막겠다"던 약속을 그는 그렇게 지켜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독일의 올리버 칸과 '야신상(최우수 골키퍼)'을 다투던 이운재는 '4강 신화'의 주연이었지만, 4년 뒤 새 막이 오르기 전 그에게 쏟아지는 시선은 곱지 않았다. 5㎏ 이상 불어난 체중, 둔해진 몸놀림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고 인터넷에서는 그의 사진이 놀림감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독일 월드컵의 막이 오르자 그동안 묻어 두었던 항변을 온몸으로 쏟아내고 있다.
그게 그의 방식이다. 1994년 국가대표팀에 처음 이름을 올렸지만 김병지.서동명 등에게 밀려 주전 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1m82㎝로 골키퍼로서는 크지 않은 키에 순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걸림돌이었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만의 '안정적인 플레이'를 갈고 닦았다. 2002년 29세의 나이에 전성기를 맞았고, 2006년 그는 대표팀의 정신적 버팀목으로 거듭나고 있다.
프랑스전은 이운재의 A매치 99번째 경기였다. 스위스전은 '센추리클럽(A매치 100경기 이상)'에 가입하는 날이다. 독일 월드컵 참가 선수 768명 중 센추리 클럽 가입자는 13명뿐이다.
임장혁 기자
![[오늘의 운세] 6월 1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