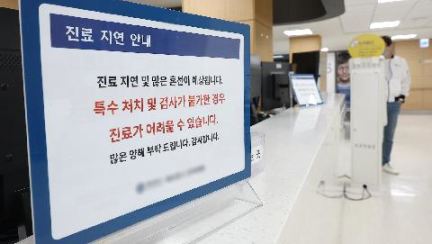권력의 탄생과 종말의 의식은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80년9월 전두환 국보위상임위원장은 최규하대통령을 밀어내고 마침내 11대대통령에 취임했다.
취임식장인 잠실체육관은 그럴싸한 구호와 화려한 오색테이프로 장식되었고 1만명이 넘는 이 나라의 「내노라」하는 인사들은 우렁찬 팡파르속에 요란한 박수로 전씨의 대통령취임을 축하했다.
전씨는 취임사에서 『대통령 자신부터 국민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마치 「성군」이나 탄생한 듯 당당하게 등장했다.
12·12사태, 5·l8광주비극을 저지르고 난 뒤끝인데도 그 정당성 여부는 차치하고 새로 등장한 권력 앞에 모두 순응하기에만 급급했다.
이로부터 8년 뒤 기자는 연희동을 떠나는 전씨부부를 다시 취재하게 되었다.
당당함을 지나쳐 「뻔뻔스럽다」고 느꼈던 잠실체육관의 전씨는 너무나 초라하고 왜소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국민 여러분이 주시는 벌이라면 어떤 고행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이 가라고 하는 곳이면 속죄하는 마음으로 어느 곳이라도 가겠다』며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지켜보며 참담한 상념에 젖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모습을 보며 『왜 진작 정치를 좀더 잘하지 못했는가』라는 아쉬움과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결국 이런 식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가』라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더우기 원한이 깊을수록 용서도 어려운 법인데 그가 속죄를 구하는 하나하나의 비정에 희생됐던 당사자들이 과연 용서해 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버릴 수 없었다.
은둔처로 떠나던 날 연희동은 쓸쓸하기만 했다.
8년 동안 그의 주변을 맴돌며 부귀와 권세를 누렸던 고관대작들은 다 어디로 가고 동네사람 10여명만이 그의 퇴양을 지켜보았다.
어느 「정치깡패」의 장례식에도 3천명이 넘는 조문객이 몰렸다는 기사가 떠올랐다.
권력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은 또 다른 권력을 찾아 떠나가 버리고 팡파르 대신 힐책의 플래시만을 받으며 홀로 떠나야 하는 자시의 모습을 보며 전씨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8년전 잠실체육관에서 그의 뻔뻔스러운 등장에 돌이라도 던지고 싶었던 그때의 마음이 초라해진 한 자연인을 보며 어느덧 허물어져 내리고 있었다. <문창극><정치부 기자>>
![[오늘의 운세] 6월 1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