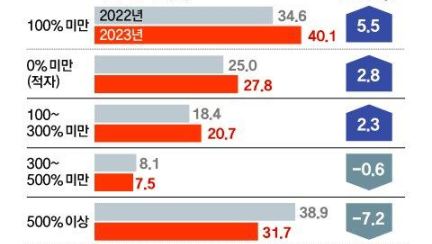노동자들이 직접 쓴 작품이면 수준이 낮아도 뛰어난 노동문학인가.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을 목적으로 쓴 글들은 문학논의에서 제외해야하는가. 지식인들이 쓴 노동문학은 거짓인가.
80년대 민중문학의 중심부로 떠오른 노동문학을 둘러싼 이같은 질문들에 대한 유연한 답변이 문학평론가 김병익씨에 의해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씨는 최근 계간『문학과 사회』여름호에 기고한 평론 『「노동」문학과 노동「문학」』을 통해 홍희담의 『깃발』, 한백의 『동지와 함께』, 정화진의 『쇳물처럼』, 석정남의 『불신시대』, 박태순의 『밤길의 사람들』등 노동자가 주인공인 노동소설 5편을 분석하면서 노동문학은 「노동자가 썼느냐 지식인이 썼느냐」하는 「창작주체」가 아닌 「쓰임새」를 기준으로 평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창작주체」를 둘러싸고 소모전을 치러온 「민중문학논쟁」의 생산적 활성화를 기대하는 김씨는 먼저 노동문학을 ▲민중(노동자)의 승리를 위한 노동운동에 우선적 목적을 두는 「노동」문학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노동현실을 다루되 문학적 성취도를 중시하는 노동「문학」으로 「분간」했다. 『깃발』『동지와 함께』가 전자 쪽이라면 『불신시대』 『밤길의 사람들』은 후자 쪽에 가깝다는 것이다.
여기서 분간의 기준은「누가 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이느냐」에 있다.
김씨는 이같은 인식 위에서 노동문학의 장래를 ▲「노동」문학에서 노동「문학」으로의 단계적 전이(문학적 성취도가 중요) ▲문학적 형태를 취하되 운동적 성과를 우선시 함으로써 「노동」문학의 자리를 고수하는 길 ▲르포·수기등 비문학적 형태로 노동운동을 논리화하는 길등 세 가지 방향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김씨는 문학적 진전이나 노동운동의 효과를 위해서나 이 세 가지 방향은 동시에 필요하며, 어느 한쪽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배타적 우열관계보다는 상호존중 및 격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문학은 그 문학적 수준이 낮아도 운동적 성과라는 쓰임새가 있으며, 노동 「문학」은 투쟁성이 낮지만 삶의 전망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문학다움」이라는 미덕이 있기 때문이다.
김씨의 「분간논리」에 따라 노동「문학」적 입장에서 보면 어떤 노동소설이 그 작가가 전문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평가절하 될 수 없듯이 작가가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문학적 성취를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노동자도 뛰어난 노동소설전문가가 될 수 있으며, 전문문인도 뛰어난 노동소설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김씨의 주장이 설득력을 지니는 이유는 『80년대 전반과는 달리 이제는 노동현장에서 나오는 문학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현저하게 발전, 그것들에 대한 문학적 자리매김이 불가피 해졌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그에 따르면 ▲노동문학은 「노동자에 의한 문학」만이 아니다 ▲「노동」문학은 문학적 성취도와는 별개로 노동운동적 효과라는 차원에서 노동 「문학」과 동등하게 중요하다 ▲그러나 문학적 입장에서 볼 때 「노동」문학은 창작주체가 노동자건 지식인이건 노동 「문학」 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형도기자>
![[오늘의 운세] 6월 1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