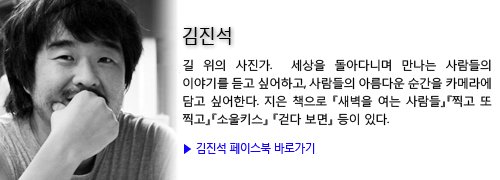EBC(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트레킹 3회
내 앞에 사람이 지나간다. 커다란 물체가 지나간다. 그 정체는 지붕을 덮을 때 쓰는 슬레이트다. 족히 사람 몸무게는 되어 보이는데 머리에 끈을 달고 천천히 걸어간다. 내딛는 발걸음에 그 무게가 느껴질 정도다. 몇 걸음 가더니 자리에 멈춰 숨을 고른다. 그렇게 조금 지나니 이미 저만치 앞에 가 있다.
이곳의 길은 사람과 동물들만 다닐 수 있다. 좁은 길과 울퉁불퉁한 길. 자전거나 오토바이, 자동차는 다닐 수 없는 곳이다. 오직 걸어서만 다닐 수 있는 길이다. 말이나 야크 같은 동물들은 소중한 교통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걸으면서 이뤄진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생필품이나 등산객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은 이곳 주민들이 직접 운반을 한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비행기로 루크라 공항까지 운반된 물건들은 분류작업을 거쳐 사람들이 직접 들고 목적지까지 운반한다. 많은 현지 주민들은 이 운송업(?)에 종사한다. 어린아이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남자 여자의 구분도 없다. 운송료는 운반하는 물건의 무게와 거리에 감안해서 책정된다. 무겁거나 먼 거리를 운반하는 경우는 대부분 힘 좋은 청년들이 맡아서 한다.
힘들게 짐을 지고 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미안하다. 물론 서로의 문화와 생활방식이 다름을 이해한다고 해도 미안함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내 몸 하나 걷는 것이 힘들어 죽네 사네 하는 내자신과 자기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짐을 옮기는 그들의 모습이 교차된다. 여행에서 이런 경우가 가장 혼란스럽다. 미안한 감정이 든다고 해서 동정을 하거나 어줍지 않은 도움을 줄 수도 없는 일이다.
또 사진을 찍을 때도 윤리적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마치 동물원에 놀러온 듯 이곳의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박제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매 순간을 고민하고 갈등한다. 내가 마음에 든다고 무조건 셔터를 누르는 것인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것이다. 우선 예의가 필요하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문화를 접했을 때는 조심스럽고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조심스러움은 셔터를 누르는 방식이고, 적극적인 것은 그들과 마주하는 것이다. 얼굴을 마주 대하고, 그들의 표정을 통해 서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진은 결국 그들의 표정을 담아내기 때문이다.
난 조금 더 그들과 친해지기로 했다. 길을 통해 그들과 함께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걷는 길을 내가 걸으며 그들이 쉬는 곳에서 같이 쉰다. 누구라도 길에서 쉬어간다. 그들에게는 삶이고 나에게는 깨달음이기 때문이다.
난 지금 여기서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배우고 있다. 아니 사람을 배우고 있다. 배우며 나를 채워가고 있다.
배움 없이 길을 걷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관광객이 되고 만다. 이들의 삶의 터전을 지나가는 관광객. 여행이 주는 이질적인 모순이다. 그렇기에 항상 마음가짐을 되새기며 스스로 주문한다.
“난 이들의 삶을 엿보기 위해 온 게 아니다. 히말라야의 일부를 보고 있는 것이다. 거대한 산과 자연,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 하나”라는 생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