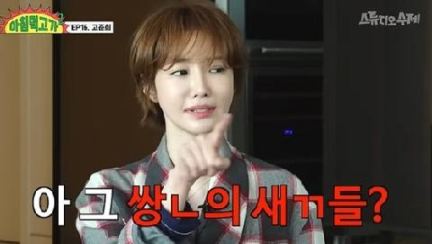전화벨이 울린다. 발신자를 확인한다. 아는 사이라도 때에 따라 골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배우자나 연인의 전화라면 다르다. “왜 그 순간 전화를 받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명쾌히 답할 수 없다면, 둘 사이는 정상이 아니다. 연극 ‘스피킹 인 텅스’의 한 부부의 대사처럼 “우리 사이가 제대로 되려면 간단명료함 하나로 충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극 ‘스피킹 인 텅스’, 7월 19일까지 수현재씨어터
호주 작가 앤드류 보벨의 대표작 ‘스피킹 인 텅스’는 1996년 초연 후 영미권에서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연극이다. 2001년 ‘란타나’란 제목으로 영화화되기도 했지만 연극성이 두드러진 작품이다. 중년 부부의 위기를 독특한 형식으로 접근해 깊은 생각거리를 던진다. 대중적이고 편안한 라인업으로 연극 관객 저변을 넓히는데 주력해온 수현재컴퍼니로선 다소 의외의 선택으로 보이지만 과감히 아시아 초연으로 들여왔다.
일단 새롭다. 실험적 형식을 빼고 이 작품을 논할 수 없다. 이야기는 부분적으로 중첩된 두 겹이다. 배우 4명이 1인 2·3역을 하며 9명의 캐릭터를 연기하고, 그 9명은 얄팍한 인연으로 복잡한 관계도를 그린다. 무대는 대체로 서로 다른 2개의 시공간이 동시에 전개되는데, 서로 비슷한 상황 또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각자가 내뱉는 대사들이 딱딱 겹친다. 방관자처럼 이야기하던 ‘남 얘기’ 속으로 들어가 어느덧 그 주인공이 돼 있기도 한다.
1막은 위기의 부부 두 쌍의 이야기다. 배우자를 사랑한다면서도 ‘뭔가 부족하다’며 ‘정말 나다운’ 또는 ‘정말 나답지 않은’ 무언가가 필요하단다. 그들은 서로의 파트너와 불륜을 시도해 성공하거나 실패한다. 냉각기 끝에 다시 만난 두 커플의 위태로운 관계는 그간 각자 목격한 2건의 실종 미스터리에 영향을 받는다.
2막은 두 미스터리의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하나로 합쳐지는 구도다. 한 여인과 한 남자가 각각 사라졌다. 여인은 실종 직전 남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자동응답기에 담긴 그녀의 메시지와 뜻밖의 목격자 제보가 사건의 단서다. 그녀는 낯선 남자의 차를 얻어타겠다는 메시지 이후 사라졌고, 태워준 남자는 그녀의 하이힐을 몰래 버리다 목격자에게 딱 걸린다.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은 건 내연녀 때문인데, 사라진 남자는 그녀에게 버림받은 전 애인이다. 내연녀는 애인이 집착하기 시작하면 떠나야 하는 병적인 습관을 정신과에서 상담받고 있었고, 그 담당의가 바로 사라진 여인이다. 부인이 사라지자 남편은 내연녀에게 집착하고, 내연녀는 그를 떠난다.

무척 복잡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무대는 의외로 단순하다. 1·2막이 액자구조에 가깝게 분리되 있기 때문이다. 의문은 하나. 각자가 연기하는 두세 개의 캐릭터에 상징적인 연관성도 없는데 왜 굳이 1인 다역을 맡겼을까. 바로 이 무대의 열쇠를 쥔 지점이다.
우리는 각자 개성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대부분 비슷한 생각,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 나와 상관없는 듯 남의 사생활 얘기를 하지만 타인의 문제가 나에게 직결되기도 한다. 경찰이나 참고인이나 점잖게 마주보고 있지만 알고 보면 둘 다 불륜남이다. 남의 연애 문제를 상담하는 의사도 실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부인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남자는 그로 인해 애인에게 외면당할 처지가 된다. 1인 2·3역을 돌고 도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가 뻔한 인간들이고 서로 다 연결되어 있음을 주장하는 효과적인 장치인 셈이다.
이들의 ‘뻔함’은 결국 하나로 수렴된다. 뭔가를 잃어버렸고, 그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다는 것. 하지만 답장 없는 편지, 응답받지 못하는 전화벨, 남겨진 신발 한 짝, 같은 공간에서 다른 시간을 이야기하는 배우들처럼 소통은 일방향일 뿐, 서로의 마음은 좀처럼 전달되지 않는다. 이들은 대체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
답은 범인으로 몰린 남자의 아내가 갖고 있다. 실직자에 누가 봐도 수상한 남편을 그녀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남편의 “아니”라는 한마디에 대한 간단 명쾌한 믿음. 그러나 그녀의 존재는 말로만 전해질 뿐 무대 위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상대방에 대한 조건없는 신뢰가 그만큼 믿기 힘든 ‘잃어버린 전설’이 돼버렸기 때문일 게다.
제목 ‘스피킹 인 텅스’는 ‘방언(方言)’으로 풀이된다. 기독교에서 성령에 충만해 혼자 내뱉지만 소통의 언어가 되지 못하고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이다. 혹시 나도 그가 대답해 줄 수 없는 말만 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그에게 명쾌한 대답을 주고 있는가. 머리도 가슴도 복잡해지는 무대다.
글 유주현 객원기자 yjjoo@joongang.co.kr, 사진 수현재컴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