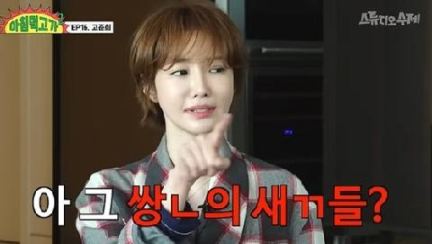가락이 먼저냐 시적 충실이 먼저냐, 오랜 기간 시조창작을 해온 중견급에서도 망설여지는 때가 많다고 합니다. 참으로 판별하기가 어렵고 어느것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고민도 하게됩니다. 여기엔 시조도 분명 시이고 보니 이의 충실에 소홀할 수가 없을 것이고 또한 가락을 가진 장르인 시조에선 리듬을 무시해서도 안되겠습니다.
그러니 양면을 고루 의식하여 창작하되 최초 습작단계에선 아무래도 시적 충실(이미지)을 염두에 두되 이를 시조화하는「리듬」에 우선하라고 말하고싶습니다. 리듬의 활용은 사실 기본율의 활용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단시조(평시조)가 지닌「융통성」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는 곧 숙달이요, 실력인 것입니다. 때문에 시적 충실만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리듬의 단절과 억지가 뒤따르고 있어 선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사실 리듬의 체득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기본율이 아닌 용통성을 여하히 요리하느냐의 기술이기 때문에 10년쯤 해야 결이 사는게 보통입니다.
『아이는 글을 읽고, 나는 수를 놓고/심지 돋우고 이마를 맞대이면/어둠도 고운 애정에 삼가한듯 들렸다.』<단란·이영도> 기본을 보다 오히려 짧은 호흡이지만 시조의 알뜰하고 진술한 성공을 보게 됩니다.
안의선의『한강에서』는 흐름의 리듬이 제법 유장합니다. 다만 관념적인 이미지가 조금 잡히기는 합니다만 두수 종장에서 극복시켜 주고 있습니다.
김희정의『부부』는 애정이 수를 놓아가는 금실이 촉촉히 잘 젖어듭니다. 마치 속삭이듯이 말입니다. 리듬에 보다 유의하시기를一.
유효영의『개화의 곁에』는 이미지를 익히는 과정이 짧았거나 정확도가 조금 결여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움이 엿보이는 건 습작의 연륜으로 봐야겠지요. 애매성과 공감을 잘 가늠해 보시기를-.
정채준의『한생각』은 별로 나무랄데가 없는 가작입니다. 초장의 출발이 매우 좋았습니다. 김복수의『봄』은 봄을 수용하는 솜씨가 능숙하고 단수의 묘도 얻고 있읍니다.<이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