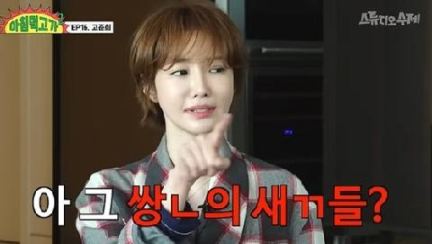국내유동성증가 상태를 정확히 평가,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상호 연관성을 찾아내어 유효한 금융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통화지표기준이 현재의 「통화」(M₁)가 아닌 「총통화」(M₂)가 되어야 하며 M₂의 규제나 조절 없이는 실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 당국이 현재 유동성 조절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국내여신 조절방식은 당초 순해외자산과 기타 순자산이 중립적이란 가정하에 총통화와 국내여신이 사후적으로 일치할 수 있다는 전제로 도입되었으나 현재 이것은 전혀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17일 금융계 및 학계에 따르면 최근의 금융구조 변화와 경제규모 대형화에 따라 경기판단자료로 이용되는 통화지표는 총통화가 바람직하며 이것은 국제적인 추세라는 것이다.
금융전문가들은 이같은 필요성을▲저축성예금 평균 잔액의 반 이상이 현금통화라고 볼 수있는 법인 저축이며▲단순한 통화 증가율 억제가 총수요와 구매력 증감에 거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총통화규제 방식은 전체적인 유통성 수준을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있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일본· 미국등이 오래전부터 이용하고 있다.
이런뜻에서 금융 당국이 4·4분기 들어 국내여신과 총통화를 늘리면서 통화증가 목표를 고수한다는 재정안정 계창의 수정은 단순히 계정 이체의 의미만 있을 뿐 수요억제등 과열된 실물부문의 조정 효과는 없다고 지적되고 있다.
저축성예금 구조만 보아도 8월말 현재 ⓛ정기적금은 70∼80%가 ①정기예금·통지예금등은 50%가량이 현금통화로 간주되는 법인저축일 뿐 아니라 ③3개월이면 인출할 수 있는 저축예금이 총저축성예금 4조4천83억원중 3천1백25억원이나 차지하는 등 가계저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 부문을 현금통화와 같이 집계해야만 정확한 통화지표를 산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금융당국은 총통화를 따로 집계하면서도 재정안정 계획등 주요 정책 지표로는 통화를 씀으로써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한 통화지표에 근거한 금융정책 수립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만 해도 기본통화지표는 M₂이며 이밖에도 M₁(M₁에 법인 저축성예금을 합한 것). M₃(M₂에 우편·농협·신용조합·신탁등을 합한 것) 등 다양한 통화지표를 산출하고 있다.
통화지표의 정확한 채택은 통화가 물가상승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때 더욱 중요성을 지니는데 일본의 경우 71년부터 72년까지 25%이상 늘어난 M₂가 74년에 30%이상 급등한 도매물가 상승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것이 실증적으로 분석되어 있으며 이같이 통화 증가가 일정한 시차를 두고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실증 분석은 한은에서도 한바 있다.
<해설> 유동성을 측정하는 통화지표는 일반적으로 M₁, M1', M₂, M₃등이 있다. ①M₁이란 현금통화(한은권)에 요구불예금을 합친 것이며 ②M₁'이란 M₁에 일반법인의 저축성예금을 더한 것으로 최근 일본 등에서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③M₂는 M₁에 총저축성예금을 더한 것이며 ④M₃는 M₂에 우편예금·농협· 수협· 신용협동조합·신탁등 비은행 금융기관 예금을 합친 지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