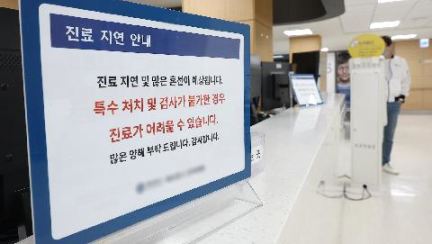「알프스」 산맥의 희생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 최근엔 입산통제론까지 대두되는 실정이다.
해마다 2백∼3백명선에 머무르던 「알프스」 희생자는 올겨울에 접어들면서 엄청나게 불어나 1윌말 현재 5백명을 돌파,「유럽」산악계에선 벌써부터 「죽음의 지붕」이란 말이 나오는 실정.
「알프스」희생자의 국적을 살피면 거의 모두 서독·「프랑스」·「이탈리아」·「오스트리아」·「스위스」 등 주변국의 등산초심자들로 휴양 또는 관광차「알프스」를 찾았다가 급변하는 날씨에 희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발 1천m쯤에 위치해있는 휴양지까지 오른 초심자들은 휴양지 인근에 널려있는 등산장비에 매혹되지 않을 수 없고, 이어서 배낭에 간단한「자일」차림으로 몇 백m 행군했다가 불행하게도 구름이나 혹한을 만나면 그대로 조난이 되는 것이다.
금년들어 1백명 이상의 희생자를 낸 서독을 예로 든다면 「바츠만」 계곡의 동벽이 이름난 조난장소. 휴양지를 벗어나 일단 조난을 당했다하면 추락사 이거나 동사, 아니면 영원히 실종되는 형태로 끝나고 만다.
최근 서독의 저명한 민간산악구조대인 「콘라트·슈트쿨하우스너·팀」이 밝힌 바에 의하면 「바츠만」2천m고지에서 희생된 숫자만 무려 92명, 때문에 시체회수작업이 주임무이다시피된 가운데 극적인 구조도 적지않다.
이 구조대가 조난사고를 확인하면 즉각 「바이에른」에 있는 연방방위「헬리콥터」구조대에 지원을 요청, 공중과 육지의 공동으로 구조작업을 진행케 된다.
그러나 아무리 장비가 좋다 해도 자연환경앞에선 굴복. 조난자가 구름속에 갇혀있다하면 아무리 조난위치를 확실히 파악해놓았다해도 구름이 걷힐때까지 손 쓸 방법이 없다.
희생자가 계속 불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방지책이 없는 게 또한「알프스」 조난의 특징.
「레저」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유럽」 인의 생리이고 보면 바로 옆에 있는「알프스」를 찾지 않을 수 없고, 또 찾았다 하면 조난의 위험이 뒤 따르는 것도 당연한 결론이다.
어느 익살꾼의 말처럼 「알프스」전체에 모조리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아야만 희생자를 줄일 수 있는지 모른다.
![[오늘의 운세] 6월 1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