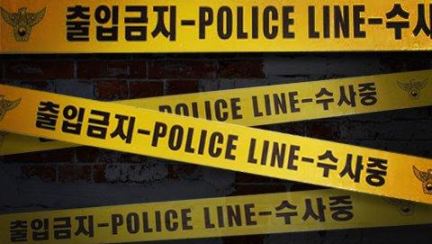임 의장은 "유권자가 시장을 누구로 찍을까 고민할 뿐, 시의원.구의원 선거에는 무관심하다"고 안타까워했다. 마음에 드는 시장 후보를 선택한 뒤 구청장을 비롯한 나머지는 같은 번호로 줄줄이 선택한다는 것이다. 투표를 하고 돌아서는 순간 자기가 찍은 지방의원 후보의 이름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소속이 발붙일 여지가 없다.
역대 선거의 통계를 살펴보면 시의원 선거가 시장 선거의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구의원은 이번 선거부터 정당공천제를 시행한다). 1995년 민주당 조순 후보가 시장이 됐을 때 시의원 당선자는 민주당 123명, 민자당 10명이었다. 98년 국민회의 고건 후보가 축배를 들 때는 국민회의 78명, 한나라당 15명, 자민련 1명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4년 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될 때는 한나라당 82명, 민주당 10명이 당선돼 의석 분포가 확 바뀌었다.
정당정치에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다수당이 의회를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어느 정도여야 한다.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장 박응격(행정학) 교수는 "시장과 같은 정당에 소속된 의원이 압도적일 때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견제와 균형이 없는 지방자치는 실패작"이라고 말했다.
특정 정당에 의원이 쏠리는 것도 문제지만 유권자가 후보의 됨됨이를 살피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시의원의 역할과 자리값을 모르고서 투표하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시의 살림살이를 위해 시민이 내는 지방세(시세)는 8조7660억원으로, 유권자 한 사람당 110만원꼴이다. 시의원 임기 4년 동안에는 440만원을 내야 한다. 46인치 최신형 LCD TV를 한 대 살 수 있는 돈이다. 이 돈으로 TV를 구입한다면 1만원이라도 싼 곳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거나 발품을 팔아 백화점.전자대리점을 둘러보고 가격을 비교한 뒤에야 제품을 결정할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같은 액수의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나를 대신해 감시할 사람을 뽑는 데는 관심 없다.
서울 시의원 한 명에게 들어가는 돈은 연간 1억원이 넘는다. 의원은 연봉 6804만원을 받지만 월급 100만원짜리 인턴을 두고 시내 한복판에 8평짜리 사무실까지 차지한다. 만일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이 같은 고임금을 받는 인력을 뽑을 때 꼼꼼히 따져보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로 문책될 것이다. 게다가 한번 뽑고 나면 지방의원이 '불량품'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환불은 물론 애프터서비스 받기도 쉽지 않다. 주민소환법이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다시 선거하려면 비용이 만만찮게 들어간다.
따라서 한번 뽑을 때 제대로 뽑아야 한다. 정보가 부족해 제대로 선택하기 어렵다고 핑계대지 말자. 집으로 배달되는 선거공보를 꼼꼼히 읽고 지하철역 입구에서 나눠주는 후보의 명함을 쓰레기통에 던지기 전에 한 번 더 눈길을 주자. 그래서 최소한 4년 뒤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는 기억할 수 있도록 하자. 민주주의 축제의 장(場)이라는 선거에서 유권자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 이 정도는 해야 한다.
김상우 사회부문 차장
![[오늘의 운세] 6월 1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