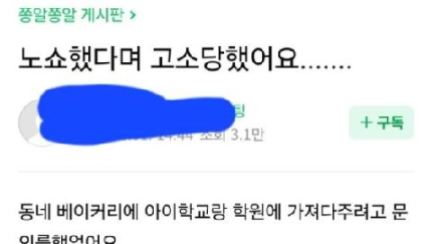![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한 제1회 대학교수법 및 학습프로그램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박남기(오른쪽)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광주교대 제공]](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4/05/5693a998-c8cf-4a3b-8b93-fd41f213de61.jpg)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한 제1회 대학교수법 및 학습프로그램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박남기(오른쪽)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광주교대 제공]
“많이 가르칠수록 적게 배운다는 말이 있죠. 교수 혼자 떠드는 강의로는 교수만 지칠 뿐, 학생은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학습의 책임자가 학생 자신이라는 걸 깨닫게 하려면 교수 스스로 많이 준비하고 노하우도 배워야 합니다.”
강의 첫 시간엔 학생 이름, 환영 문구 칠판 붙여 #수업 내용은 예습 과제로, 강의는 학생과의 질의 응답 #“많이 가르칠수록 적게 배워, 혼자 떠드는 강의는 효과 낮아" #"시선 피하는 학생부터 질문하니 조는 학생 사라져" #"교수가 강의실 밖에서도 학생 만나야 강의도 성공"
지난달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한 ‘제1회 대학교수법 및 학습프로그램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박남기(57)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의 설명이다. 이 대학 총장(2008~12)을 역임했던 그는 1993년부터 예비교사에게 교육행정학, 학급경영론을 가르쳐왔다. 박 교수는 공모전에 출품했던 원고를 바탕으로 지난달 ‘최고의 교수법’이란 단행본도 출판했다.
5일 박 교수는 “강의 첫 시간이 한 학기 강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첫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학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학기 첫 강의마다 학생들의 이름과 환영 메시지를 출력해 칠판에 붙인다. 출석 체크는 성을 뺀 이름으로 부르면서 반드시 학생의 눈을 마주보고 미소를 짓는다. 첫 강의를 끝내기 전엔 학생들에게 한 학기 강의에서 원하는 점을 담은 설문지를 받고, 모두 모여 기념 사진도 찍는다.
박 교수는 “25년 이상 강의하면서 도달한 결론은 가르침은 만남이고 소통이고 나눔이라는 점”이라며 “대학 강의실도 따스한 가슴을 지닌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공간이 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의 시작 후 2주 지나면 이름을 불러줄 수 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2015년 2학기 첫 수업을 마친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가 교육학과 수강생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했다. 박 교수는 매 학기 첫 수업에서 학생들의 이름과 환영 메시지를 담긴 배너를 제작해 강의실에 붙인다. [광주교대 제공]](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4/05/b407f914-dff7-4fbe-9b3a-9e0e9d7b0063.jpg)
2015년 2학기 첫 수업을 마친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가 교육학과 수강생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했다. 박 교수는 매 학기 첫 수업에서 학생들의 이름과 환영 메시지를 담긴 배너를 제작해 강의실에 붙인다. [광주교대 제공]
박 교수의 강의는 예습, 과제가 많은 편이다. 매번 수업 전에 읽을거리가 있고, 예습 여부를 확인하는 퀴즈를 치거나‘1분 보고서’를 요구한다. “교수가 떠먹여주는 강의, 예습ㆍ과제가 없고 강의 시간에 필기할 필요가 없는 강의는 학생들의 기억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강의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한다. 박 교수는 “강의가 예습한 내용을 재탕하는 방식이어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강의와 예습 내용이 중복되면 평소 예습하던 학생도 소홀해지기 때문이다. 그는 “재탕 강의 대신 예습으로 얻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의 강의엔 규칙이 있다. 강의가 시작하면 우선 학생들의 질문에 박 교수가 답한다. 학생 질문이 멈추면 이제 박 교수가 학생에게 질문을 던진다. 시선을 피하거나 다른 곳을 바라보는 학생부터 질문을 받게 된다. 박 교수는 “이런 규칙을 적용하니 질문거리를 찾기 위해 예습도 충실히 하고, 강의 중 조는 학생도 사라졌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강의가 성공적이 되려면 강의 외 시간에도 학생을 만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수의 빠른 피드백도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요소다. 시험 결과나 제출한 보고서는 평가와 함께 1주일 내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의에서 각종 학습 어플리케이션, 블로그를 적극 활용하는 그는 마지막 수업에선 꼭 종강파티를 한다. 학생 이름에 ‘선생’이란 호칭을 넣어 마지막 출석을 부른다. 박 교수는 "교사가 되기 위한 첫 관문은 통과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의 마지막은 미리 준비한 편지글을 학생에게 나눠주고, 박 교사가 직접 읽는다.
박 교수는 “강의는 어떤 기술이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이라며 “제4차 산업혁명에서 ‘인간 교사’가 살아남기 위해선 단순한 교수법이 아니라 가슴으로 가르치는 교수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가 나름의 교수법을 정립, 출간한 '최고의 교수법' 표지
![[오늘의 운세] 6월 1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