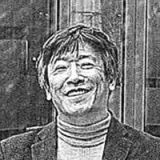강홍준
강홍준사회1부장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오래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고맙긴 하죠. 그런데….” 최근 한 모임에서 지인이 올해 고교에 입학한 딸을 소재로 이렇게 말을 꺼냈다. 그래도 10분도 안 돼 엉덩이 들썩거리는 우리 아이보다 낫지 않으냐는 주변 분의 한숨 섞인 이야기가 나오자 모임 분위기는 이상하게 흘러갔다. 지인이 하려던 이야기의 핵심은 오래는 앉아 있는데 성과가 낮다는 거였다. 그런데 그의 걱정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으로 에워싸였다. 강력 본드로 애 엉덩이를 확 붙여버리고 싶다는 분도 나왔을 정도였으니까. 급기야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는 입시업계의 ‘구루’ 손 사탐의 명언을 다시 되새기는 걸로 이날 화제 중 하나는 마무리되고 있었다.
기본적인 양(공부량)이 바탕이 돼야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엔 대부분이 동의한다. 그런데 양은 충분해 보이는데 성과가 낮다면? 그럴 땐 외양(엉덩이 의자 고정)은 그럴싸해도 실제는 다르다는 쪽(머리는 딴 생각)으로 추론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속으론 진짜 찜찜하다. 머리가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의문이 몽실몽실 피어 오른다. 머리라면 누구 탓을 해야 하나? 나 아니면 다른 쪽? 이쯤 가면 자녀 문제가 부부간 갈등 소재로 대반전한다.
부모가 스스로 학창 시절 누가 더 공부를 잘했는지 같은 유치한 단계로 나갔다면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간 상태다. 중·고교 내신이나 수능 공부는 하워드 가드너의 여덟 가지 다중지능 중 두 가지(언어, 논리·수학적 지능)면 충분하다. 다양한 지능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다. 다만 등수 또는 점수로 나타나는 성과를 측정한다는 시험 변수가 있을 뿐이다. 내신이나 수능 모두 제한된 시간 내 지문(정보)을 읽고 요구사항(출제자의 의도)을 파악해 답을 내야 한다. 이런 특성의 시험에선 지속적으로 머릿속에 채워 넣은 다양한 정보를 꺼내 빠르게 결합한 뒤 판단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
다시 지인의 걱정거리 해결이란 과제로 돌아가보자. 성과가 낮은 건 학습 능력 또는 학습 지능이 낮기 때문이 아니다.
평소 학습을 통해 채워 넣은 정보를 시험 때 꺼내 출제자의 요구에 맞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데 원인을 찾아야 타당하다. 특히 이런 학생에게 흔히 벌어지는 잘못은 출제자의 요구사항을 자기식으로 해석해 출제자가 미리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오류다. 백번 양보해 노력에 비해 성적은 좀 낮다고 치자. 학교 밖 세상 사는 데 별 큰 문제는 없다.
강홍준 사회1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