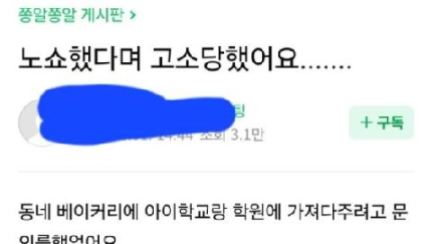대니 로드릭
대니 로드릭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
지난달 초 하버드 대학의 동료 그레고리 맨큐 교수가 진행하는 경제입문학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한 일이 있었다. 이들은 “맨큐의 보수적인 교육 때문에 현재 정책 결정자나 은행가인 하버드 대학 출신 선배들이 사회의 불평등 현상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세계적인 대학에 재학 중인 이들 학생 역시 근대 경제학에 항의하는 월가 시위대에 동조하고 있다. 경제학에 대한 비평은 언제나 존재한다. 하지만 금융위기와 그 여파는 불투명한 취업과 시장 불균형 등을 외면한다는 경제학에 대한 오랜 비난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비쳐졌고, 시위대에는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맨큐 교수는 항의하는 학생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경제학은 이념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를 인용해 경제학은 처음부터 정책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생각하고 정답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문이라고 설득했다.
몇년간 경제학 연구에 몰두한 사람이 아니라면 경제학 박사과정의 수업은 특정한 상황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정책들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제연구는 정부의 개입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지를 확인하고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에는 경제외적인 동기나 사회적 협력행위 역시 점차 경제학자의 연구분야가 되고 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생각해보라. 거시경제학과 금융은 금융위기가 어떻게 발생해 확산됐는지를 설명하는 장치를 놓치지 않았다. 실제로 학술 문헌은 금융 거품과 비대칭 정보, 자극적인 왜곡, 자기 충족적인 위기, 그리고 시스템적인 위기 등의 모델로 가득차 있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 중차대한 시기에 효율적이면서도 자기조정 능력을 갖춘 시장의 특성을 강조하며 경제학 문헌에 나와있는 이들 모델을 등한시했다. 이는 정부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금융시장을 간과하는 실수로 이어졌다.
필자는 저서 『세계화 패러독스』에서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기자들로 하여금 경제학 교수들에게 전화를 걸어 X라는 나라와 Y라는 나라가 자유무역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질문을 하게 하자. 분명 우리 경제학자들은 열정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답변을 할 것이다.
다음엔 그 기자를 대학원 국제무역론 세미나에 잠입시켜보라. 그리고 “자유무역은 옳은가”하는 똑같은 질문을 시켜보라. 아마도 교수의 즉답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교수는 대답도 하기 전에 수많은 질문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옳은’이란 어떤 의도인가” “그리고 누구를 위한 옳음인가”라는 질문들 때문이다.
오늘날 자유무역의 장점을 설명하는 직접적이고도 절대적인 규정은 온갖 불평과 변명으로 치장된 선언이 돼 버렸다. 이상하게도 교수가 대학원생들에게 자랑스럽게 전달하고 있는 지식은 일반 대중에게는 부적절한(혹은 위험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교수들의 이런 고민은 학부생들의 경제학 수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경제학은 우리들에게 금융위기에 대처할 올바른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경제학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것’이 아닌 ‘세미나 룸의 그것’이 되어 버렸다. 한계를 인식하고 그 속에서 현실에 입각한 적절한 메시지를 제시하는 게 바로 경제학인데도 말이다. 학자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다양성을 경시하는 행위는 결국엔 현실세계에서 이들을 보다 나은 애널리스트로 성장시키지 못한다.
대니 로드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
정리=박소영 기자 ⓒProject Syndicate
![[오늘의 운세] 6월 1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