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박사의 ‘9988234’ 시크릿]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민수 박사
우리 아이들이 진짜 위험한 까닭은 먹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방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진료실에서 마주치는 소아비만 아동의 대부분은 음식에 대해 감사는커녕, 당연하다는 생각조차 가지지 않는다. 어떤 아동들은 이 놈 때문에 살이 쪘다며 입에 들어갈 때의 허겁지겁과는 달리 증오심마저 드러내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전 세계의 널리 알려진 장수촌들을 살펴보면 백세노인들은 보통 식사에 1시간이상을 투자한다. 백세노인들에게 물어보면 식사시간이야말로 하루를 열심히 산 자신에 대한 보상이며 헌신이다. 더불어 오늘의 식사가 있기까지 수고해준 모든 사람들과 과정에 대한 감사의 시간이다.
그러나 지금의 식탁의 풍경을 보라. 지금의 식사는 아이들에게 뭔가 의무적이고 바쁘고 빨리 끝내야 하는 귀찮은 그 무엇인가로 조건화되어 있다. 간혹 어떤 식탁은 전쟁터이기도 하다. 먹이려는 엄마와 피하려는 아이들의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 그러다 보니 감사와 고마움으로 넘쳐야 할 식탁에는 투정과 불평과 고성이 난무하다. 이것은 의무감을 강요하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하나의 음식이 만들어져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지구상의 대부분은 아직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
나는 가끔 진료실을 찾는 아이들에게 넓은 세상을 보라고 이야기한다. 아직도 세계의 많은 어린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준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에게는 식사 자리에서 아이를 기분 좋게 해주라고 말한다. 뭐니뭐니해도 아이주도 식사교육의 백미는 아이가 즐겁고 유쾌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사자리에서는 일체의 비난이나 잔소리를 금지하고 아이가 기분좋아할 일을 주로 해라. 기분이 나쁜 아이는 음식을 싫어하거나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된다. 즉 결식이나 편식 등의 음식투정, 그리고 과식이나 폭식 등의 음식탐닉은 즐겁지 않은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음식감사 교육
하나, 바른 식사에는 바른 철학과 윤리가 필요하다.
먼저 음식과 식사의 가치를 잊고 사는 지금의 세태에 대한 통찰과 반성이 필요하다. 음식의 가치 회복이 필요하다. 음식은 우리를 살리는 바탕이다. 또 음식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바른 심성의 근본이다. 음식이 주변에 넘치는 현대인들은 음식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살기 쉽다. 음식을 함부로 대하고, 공략 대상이나 낭비와 사치의 목록으로 삼는 일이 잦아진다.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조차 음식을 소중한 대상이 아닌 한낱 수단으로 여긴다.
둘, 음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치자.
식사 전 잠시 일용할 양식을 준 신과 자연에게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일은 반드시 종교인이 아니라도 본받을 점이다. 음식에 대한 감사를 잊으면 음식 또한 불순해진다.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정체 미상의 음식이 늘어난다. 단지 혀끝에 느껴지는 맛이나 포만감만 만족시키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겉만 번지르르할 뿐 온갖 독소와 오염물질들이 가득한 음식들도 우리 주변에 가득하다. 음식에 대한 바른 생각이 사라지면서 세상에도 나쁜 음식들이 만연하게 된다.
셋,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고 아이들을 동참시키자.
사랑이 없으면 아이들에게 푸드디자이너로서의 열정과 카리스마를 보여줄 수 없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엄마들이 식사를 준비하면서 ‘하기 싫어, 내가 미운 남편을 위해 이 음식을 만들어야 해?’ 하면서 음식을 만들고 있다. 미움이나 투정, 불평이 담긴 음식을 먹는 아이들 역시 음식에 담긴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 음식에 애정을 담고 그 과정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자.
넷, 음식의 가치를 해치는 이 말들은 반드시 피하자.
‘또 배고프다고 뭘 그러니? 귀찮게끔’
‘대충 때우자’
‘밥하기 귀찮으니까 나가서 먹자’
아이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먹는 것이 신성한 행위나 소중한 시간이 아닌 대충 때워야 하는 시간으로 때로는 식사에 대한 경시의식이 몸에 배게 된다.
다섯, 내가 먹는 음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나에게 오는지를 알려주어라.
씨앗을 뿌리는 과정에서부터 수확하여 우리 집에 배달되어 오는 과정까지 얼마나 손길들이 내가 먹는 한 톨의 밥에 담겨있는지를 알려주어라. 가장 좋은 교육은 현장에 직접 나가 땀 흘리는 농부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이전 바로 우리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우리가 소비하던 시대의 기억을 조금이라도 되살리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도 시골집에 가서 농부들이 직접 수확하는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는 밥이라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 식탁에 올라오고 그 과정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농촌 가보기 운동은 식사가 만들어지기까지의 노고를 되돌아보는 시간뿐만 아니라, 도심아스팔트에 갇힌 아이들에게 흙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박민수 가정의학과 전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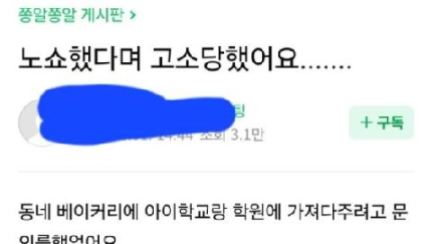
![[오늘의 운세] 6월 1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