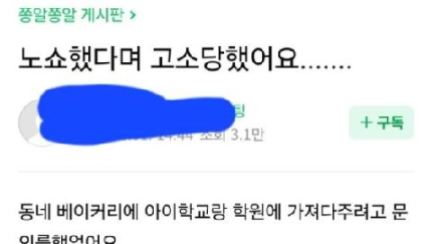김 정 수 전문기자
2006년 고이즈미가 총리에서 물러났을 때부터 불안했다. 그가 애써 되살린 일본 재생의 불씨가 꺼져 버릴 것 같았다. 2009년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잠시 희망을 가져봤다. 불황과 무기력의 일본이 다시 일어서나 싶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일본을 더 깊은 골짜기로 밀어 넣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그런 일본을 닮아 가고 있다.
일본은 통 큰 씀씀이로 나라를 망친 전형적인 예다. 1990년대 초에는 그럴듯한 핑계가 있긴 했다. 버블 붕괴 후 불황이 있었다. 정부는 경기 부양으로 맞불을 놓았다. 일단 시작된 돈 쓰기는 멈출 줄 몰랐다. 총리가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뀌어도 쏟아 붓는 돈은 늘어만 갔다. 공공사업에, 지방 발전에, 복지 확충에 돈 뿌리기 20년. 남은 건 빚더미였다. 통 큰 씀씀이가 일본 만병(萬病)의 근원이었다.
최소한의 개혁의지도 없는 리더의 등장이 일본 내리막의 시작이었다. 일본 재생은 나 몰라라, 총리 자리 욕심 말고는 아무 생각이 없는 리더, 국민에게 비전과 믿음을 주지 못하는 이름뿐인 리더. 그래서 기껏해야 포퓰리즘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리더. 그들이 만들어 낸 게 오늘의 무기력한 일본이다.
무기력한 일본은 정권 한두 개, 총리 한두 사람의 탓이 아니다. 수십 년에 걸쳐 ‘무책임 일본’ 전체가 스스로 떠안은 부실 종합세트다. 혜택에 따르는 부담을 애써 외면하고 싶은 국민, 쏟아질 비난이 두려워 감히 국민에게 개혁의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는 총리, 나라야 어찌 됐든 정권을 잡을 수만 있으면 한없이 무책임해지는 정치권, 자기 사업에 돈 내놓으라고 관료를 윽박지르는 족(族)의원(일본에선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의원을 족의원이라고 부른다), 힘있는 정치인을 등에 업으려 나랏돈을 제 돈 쓰듯 하는 관료, 그 족의원에 빌붙는 업자(이 먹이사슬을 관(官)·정(政)·업(業) 간의 ‘철의 삼각’이라고 부른다)…. 이들이 저질러 놓은 게 오늘의 부채대국 일본이다.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00%를 넘는 나라, 한 해 거둬들인 세금보다 빚이 더 많은 나라, 민간으로부터 빚을 못 얻어 우편저금에 손대는 나라, 그런데도 ‘보육비 더 준다, 고속도로 무료다, 학자금 대준다’고 꼬드긴 정당이 집권한 나라…. 이게 공짜망국 일본의 모습이다. 행여나 누가 배울까 겁난다. 아니, 벌써 배우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다.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0년’ 동안 일본이 딱 한 번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았던 적이 있었다. ‘잃어버린 10년’으로 일본이 바닥이었던 2001년 4월(그때는 그게 바닥인 줄 알았다) 고이즈미가 총리가 되고 난 뒤의 5년5개월이 바로 그때다.
‘관(官)에서 민(民)으로’의 기치 아래 고이즈미는 ‘공(公)’ 자가 붙은 모든 것을 줄이고 깎았다. 공공사업은 한 해 수조 엔씩 깎았고, 공기업은 136개를 없애거나 민영화했다. 국가·지방공무원도 수만 명(4.5~5%)을 내보냈다.
고이즈미의 ‘작은 정부’ 개혁은 마이너스 성장을 플러스로 돌려놓았다. 정부 도움 없이 민간(투자와 소비) 스스로 끌고 가는 경제로 바꿔 놓았다. 줄어들던 세수는 증가세로, 늘어나던 재정적자는 균형으로 방향을 틀어 놓았다. 2010년대 초에는 나랏빚 감축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10여년 만의 일본 재활에 국민도 자신감을 되찾았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그 건실(健實) 일본은 그 후 개혁 소신도 국민 지지도 없는 5명의 총리를 거치면서 다시 부실(不實) 일본이 됐다. 오늘의 일본 재건에 필요한 건 증세가 아니라 뉴 고이즈미다.
나라 돌아가는 모습, 국민의 성향, 정치인과 리더들의 행태를 볼 때 지금 우리에게도 ‘한국판 고이즈미’가 필요할지 모른다. 물론 요즈음 분위기로 봐서는 나라 살림이 일본만큼 위태위태해질 때까지는, 그런 인물이 리더로 등장하기 힘들 것 같지만.
김정수 전문기자



![[오늘의 운세] 6월 1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