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도 빼먹고 나왔는데…, 영 맥빠진 주장들만 나오네요."
지난 27일 오후 서울 남산 영화감독협회 시사실에서 영화상영 등급분류 세부심의기준 제정을 위해 열린 세미나 현장. 토론자로 참가한 강한섭(서울예대)교수는 심드렁했다. 토론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방향으로만 흘렀기 때문이다.
이날 세미나가 열린 배경은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다. 이례적으로 영상물 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직접 나서 세미나를 연 것은 노인의 성(性)을 노골적으로 다룬 영화 '죽어도 좋아'가 남긴 제도적 문제점 때문이다. 영화가 두 번에 걸쳐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자 일부 문화단체들이 영등위의 개편과 김수용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에 이르렀고, 영등위는 이들의 주장를 수렴한다는 취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이다.
그나마 참가자들의 관심을 끈 발언은 이동연(문화개혁시민운동 사무국장)씨와 김준덕(동덕여대)교수의 주장 정도였다. 이씨는 "현재 영상물 등급분류는 지나치게 성기(性器)중심"이라고 지적했고, 김교수도 "성적인 표현보다 더 중요한 건 폭력적인 장면인데 폭력성에 대한 관심이 적다"고 지적했다.
영화등급을 둘러싼 문제는 늘 찬반양론의 극한 대립을 불렀다. 사실 이런 과정을 통해 현재 등급분류제도로 발전해 온 측면이 있다. 특히 전체 관람가 12세·15세·18세 이상 관람가에다 '제한상영가'등급이 신설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상당히 해소한 것도 사실이다. 제도로만 보면 현재 등급분류제도는 큰 무리가 없다.
문제는 '제한상영가'등급이다. '제한상영가'등급은 성적 표현이나 폭력성이 극히 위험스럽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극한적인 조치다. 그런데 '제한상영가'등급 영화를 상영할 극장이 없기에 사실상 상영금지가 되는 셈이다.
'죽어도 좋아'의 경우도 제한상영가 전용극장만 있었다면 아무 문제가 안된다. '제한상영가' 전용극장이 적자일 것이 뻔하기에 아무도 전용극장을 만들지 않는다. 민간에서 전용극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영화진흥위원회나 관련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싶다. 그렇게 해서라도 해묵고 비생산적인 '표현의 자유' 시비가 해소되길 바란다.
이영기 기자
leyoki@joongang.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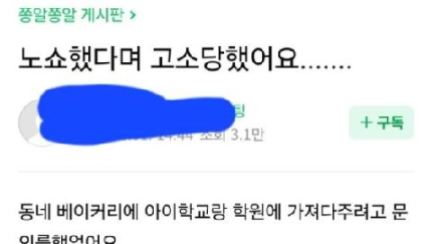
![[오늘의 운세] 6월 1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