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 장사란 말이 있다. 시원찮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내놓고서 아는 사람들을 끌어들여 수지를 맞추는 거래가 바로 그것이다.
요즘 검찰의 수사로 불거져 나온 우리 방송사와 연예 기획사의 거래가 딱 그렇다.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이끄는 최고 경영자들은 대개 이쪽 판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다.
실제로 젊은 시절 방송사를 다니면서 쌓은 '안면 노하우' 하나만으로 이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례도 흔하다. 눈치만 빠르면 연예 기획사의 차량 운전 기사가 이를 전공한 해외 석·박사보다 낫다고 할 정도다.
얼마 전 이 분야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한 사업가의 말이 정곡을 찌른다. 음반을 냈으니 이젠 홍보를 해야 하는데 굳게 내걸린 방송사의 자물쇠를 열 방도를 찾지 못해 결국 자본금을 다 날렸다고 한다. 차라리 남들처럼 돈을 뿌리려고 마음먹지 않았다면 스스로는 덜 한심했을 것이란 게 그의 고백이다.'낯선 사람들의 돈은 절대 먹지 않는다'는 그 세계의 룰에 밀려 새 길을 찾아 헤매는 사이 음반은 죽어버렸단다.
문득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문화 비평가 아도르노의 에세이 '온 포퓰러 뮤직(On Popular Music)'의 한 대목이 떠오른다. 대중음악은 사회와 너무 밀착돼 잘못된 구조적 현상을 유지토록 하는 데 일정 역할을 한다는 것. 이에 아도르노는 대중음악을 '사회적 접착제(Social Cement)'로 규정했다. 우리 연예 기획사의 비리가 유상증자를 빙자한 횡령, 주식 로비 등으로 벤처기업의 그것을 닮고 있는 대목에서 그 지적은 더 맞아 떨어진다.
해법은 쏟아지고 있다. 프로덕션과 음반 메이커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대안 제시에서부터 방송사가 기존의 음악 프로듀서 말고 한두 명의 '게이트 키퍼(감시자)'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다가선다. 가수 활동의 중심 축을 방송 프로그램에서 라이브 무대로 옮기자는 얘기도 의미를 지니긴 마찬가지다.
하지만 우리의 검은 거래는 이런 대안의 메커니즘조차 무력화할 만큼 강력하다는 이 곳 종사자들의 지적을 경청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예컨대 그들이 게이트 키퍼 역할을 맡은 프로듀서조차 매수하려 든다면 결국 비리의 폭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엉킴이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판단해야 할 것 같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두 '시장'의 원칙 아래 서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의심의 눈초리는 주로 지상파 방송 3사에 쏠리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분산시키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인 구조가 해소돼 출연 프로그램이 늘어난다면 일부 프로듀서에게 몰린 '대중음악 권력'은 자동 소멸할 게 뻔하다. 그게 바로 시장의 힘이다.
연예 기획사에도 물론 시장원리가 필요하다. 특히 그 메커니즘 작동의 초점을 최고 경영자들의 변신에 맞춘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긍정적이다. 이를 위해선 대중음악 소비자들의 힘이 절실하다. 관련 시민단체가 이번 비리의 표적이 되고 있는 몇몇 인사를 향해 1인 피켓 시위를 벌이는 것은 이를 향한 작은 걸음으로 간주할 만하다.
연예인들은 천사의 얼굴을 한 채 전파를 타고 날아와 안방에서 춤을 춘다. 그 중 상당수는 스타라는 이름을 달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다. 감춰진 비리의 고리를 그냥 방치한다면 그들에겐 '하얀 분칠을 한 검은 악마'란 이름을 달아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달 26일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 검찰에 제출한 '더 이상의 수사 확대는 연예계를 위축시킨다'는 탄원은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대충 넘어갈라 치면 우리는 다른 음악 프로그램일랑 다 끄고 차라리 일요일 정오에 방송하는 '전국 노래자랑'이나 즐기는 편이 나을지 모를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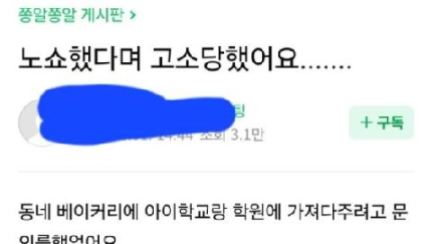
![[오늘의 운세] 6월 1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