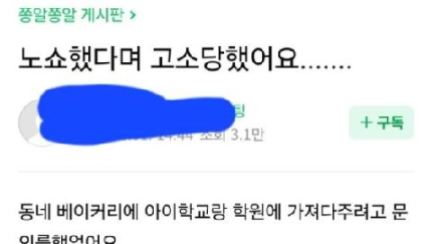독일통일 사례를 남북관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일부 지적도 있지만 서독정부의 파격적인 동독 지원책으로 통일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이 아닐 수 없다.
1972년 5월 26일 에콤 바 서독 총리실 사무차관과 미하엘 콜 동독 총리실 사무차관 간에 '통행협정'이 체결될 수 있었던 것도 경제난에 시달리던 동독이 거부하기 어려운 조건을 서독측이 제시했기 때문이었다.
이 협정의 체결로 61년 8월 동독 정부가 베를린 장벽을 설치한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서독~서베를린 간의 자유왕래 및 이산가족 등의 동.서독 방문이 허용되는 등 통일의 물꼬가 트이게 됐다.
서독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서독 주민의 동독지역 방문과 관련해 "통행료와 사증비용을 연간 고정액으로 일괄지불하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액수는 5년 동안 연 2억3천4백90만마르크(약 1천4백억원)이고, 이후엔 인상할 수 있다는 여운도 남겨 동독측이 뿌리치기 어려운 전략적 접근을 시도했다. 이 협정은 서독의 '동독 지원' 신호탄이 됐다.
72년 12월 동독과 '기본조약'을 체결한 서독은 각종 분야에서 지원을 했다. 90년 통일 때까지 18년간 서독 정부 차원의 지원액은 모두 2백96억5천만마르크로, 연평균 16억5천만마르크(약 9천9백억원)다.
이중 액수가 가장 많은 것은 동.서독 주민의 왕래를 위한 통행료 일괄지급금으로 78억마르크가 건네졌다. 특히 극심한 외채난을 돕기 위해 83년 동독 차관(10억마르크)에 대해 지불보증을 해준 것이 양국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됐다.
서병철(徐丙喆)통일연구원장은 "서독은 '예산 1%'라는 형식을 취하진 않았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국민총생산(GNP)의 0.3%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따르면서 이를 동독지원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특히 비밀협상을 통해 현물 및 현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동독에 억류됐던 정치범 3만3천7백55명이 석방되고, 40만명의 동독지역 이산가족이 서독으로 이주할 수 있었다.
정세현(丁世鉉)국가정보원장 대북특보는 "한때 서독에서도 야당 등에 의해 '퍼주기 논란'이 제기됐으나 경제지원을 통해 서독 의존도가 높아진 뒤 동독에서 개방.개혁현상이 나타나자 종식됐다"고 말했다.
이철희 기자



![[오늘의 운세] 6월 1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