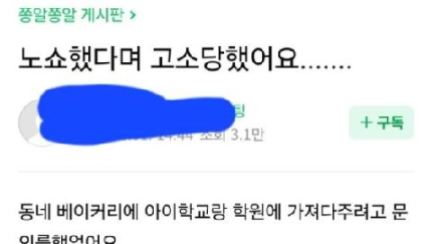문화재를 둘러보는 일에도 더러 타이밍이 필요하다.
불과 십수년 안쪽만해도 수많은 불화(佛畵)들이 감쪽같이 없어지거나 김제 금산사 대적광전이나 화순 쌍봉사 대웅전 처럼 잿더미가 돼버리기도-그 후 복원은 했지만-했고, 오랜 풍상으로 다시 손을 보느라 설명문만 보고와야하는 경우도 적잖기 때문이다.
전북 익산에 가면 미륵사지 서탑(국보 11호)이 있다. 백제 무왕(武王, 600-641)때 지어진 이 탑은 1915년 조선총독부가 보수했다지만 콘크리트로 무너진 곳을 메운데 불과했다.
그나마 붕괴 위험이 있어 문화재청이 전면 해체보수를 결정해 이달에 준비작업을 한다. 해체.보수에는 짧으면 5년, 길게 10년은 걸린다고 해 익산으로 길을 재촉했다.
익산 미륵사는 원래 3개의 금당(金堂)과 3개의 탑(동.서 석탑과 중앙의 목탑), 거대한 회랑과 승방.강당을 갖춘 백제 최대의 사찰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6층까지만 부분적으로 남은 서탑과 당간지주, 발굴 조사로 노출된 주춧돌 등 유구(遺構)에서 옛 모습의 편린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동탑이 있던 자리에는 7년전 세운 9층 석탑이 있다. 건립 당시의 화려했을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뜻이겠지만 폐사지에서 갖는 쓸쓸함이랄까 고즈넉한 느낌이 깨뜨려지는 듯한 아쉬움도 남는다.
미륵사지 서탑을 보면 보통 탑과 다르다는 느낌이 강하다. 거대한 크기도 크기지만 수많은 돌을 짜맞춰 쌓아올라간 모습이 고층누각을 연상케한다.
야트막한 단층기단에는 계단을 만들어 오를 수 있게 했고 탑 1층 사방으로는 작은 문을 냈다. 바깥기둥들은 4각기둥이면서도 위를 좁히고 중간 조금 아랫부분을 통통히한 배흘림으로 다듬었다. 기둥 위로는 기둥을 가로지르는 창방과 평방을 댔다. 모서리를 살짝 치켜든 지붕 처마는 기단을 덮고 있다.
이는 목조건축물의 특징 그대로다. 기단과 1층의 모습을 보면 정면.측면 3칸씩인 건물과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다. 미륵사지 탑을 우리나라 석탑의 시원(始源)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탑의 재료는 크게 벽돌.나무.돌이 있다. 이 중 어떤 것을 주재료로 삼는가는 자연환경과 관계가 깊다.
인도와 중국이 무진장한 황토진흙과 풍부한 인력으로 거대한 벽돌탑(塼塔)을 쌓았다면, 화산과 지진으로 좋은 석재를 구하기 힘든 일본은 울창한 난대림의 목재를 활용해 목탑을 세웠다.
반면 우리는 전국에 널려 있는 1천여기가 대부분 석탑이다. 불교 전래 초기부터 세워진 목탑이 병화(兵火)로 사라진 탓도 있지만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화강암을 쉽게 캘 수 있는데다 돌을 다루는 뛰어난 솜씨로 석탑이 목탑을 대체해 나갔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의 시원이 바로 미륵사지 서탑이다. 백제 석공들이 만들어낸 석탑은 점차 간략.추상화하면서 불국사 석가탑과 같은 세련된 모습으로 한국 불교조형미술의 중심에 섰다.
익산〓박태욱 기자
![[오늘의 운세] 6월 1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