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의 경제위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다음해의 경제호전이 통계숫자 상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게 마련이다.
국내총생산 (GDP).국민소비.민간투자 등등이 다 1년 전 숫자와 비교하는 통계들이므로 지난해의 국가경제가 힘들었으면 힘들었을수록 올해의 거시경제지표는 반짝하게 마련이다.
지난해 - 5.8%를 기록한 우리나라의 실질경제성장률이 올해에는 +4~5%로 예상된다고 바로 우리 경제가 국제통화기금 (IMF)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큰 오산이다.
또 전년 대비 10~11% 정도의 경제 성장률 반전 (反轉) 은 한국뿐만 아니라 혹독한 경제위기의 홍역을 치른 국가들은 대개 경험하는 현상이다.
예를 들면 94년말 극심한 금융위기를 겪었던 멕시코의 경제성장률은 95년 - 6.2%에서 96년 +5.2%로 11.4%포인트의 반전을, 지난해 우리나라와 똑같이 IMF위기를 맞았던 인도네시아와 태국도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각각 - 13.1%와 - 7.8%에서 올해는 - 2.5%와 +2%로 약 10%포인트 정도의 성장률 반전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므로 더 중요한 문제는, 정부가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국제경쟁력을 어느 정도 향상시키고, 한시적인 일용.임시직 근로자들을 안정된 상근취업자로 전환시켜 고용률의 질을 높임으로써 지난 20~30년간 우리나라가 누려왔던 경제성장률에 다시 접근할 수 있는 비전과 마스터플랜이 과연 있느냐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정부 생각은 우리의 금융개혁을 성공시키고 빅딜 (대기업간 사업교환) 을 통한 재벌개혁을 완성해 선단식 대기업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벤처업 등 중.소기업 육성으로 위기의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것 같다.
그러나 IMF 등 국제기구와 미국 정부의 다분히 정치적인 칭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금융개혁은 최근 들어 뒷걸음질치고 있는 현실이다.
막대한 부실금융의 책임을 지고 당연히 우리나라 금융계에서 영원히 물러났어야 할 전직 금융인들이 다시 지연.학연 등을 총동원한 로비활동으로 현업에 착착 복귀함으로써 새로운 정경유착과 신관치금융을 부활시키고 있다.
이들을 효과적으로 제재해야 할 금융감독자들 스스로가 지금까지의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의 제도 속에서 출세가도를 걸어왔던 당사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 사이비 금융인들의 복귀를 음으로 양으로 묵인.방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빅딜을 주축으로 한 재벌개혁 정책이 뚜렷한 목표와 국가경제적 손익 (損益) 계산 없이 정치논리와 해외금융가들의 장단에 따라 숫자 맞추기식으로 진행됨으로써 과연 빅딜 이후 한국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얼마나 향상될지 의문이다.
세계경제는 80년대까지는 고질적인 인플레 아래서의 경영체제로 운용돼 왔으나 90년대부터는 가속화한 국제화와 하이테크 영향으로 디플레이션 체제속의 국제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경제운용의 패러다임 속에서는 전세계적인 과투자와 잉여시설로 허덕이는 자동차.반도체.철강.석유화학 분야가 앞으로 가장 출혈적인 경쟁을 당할 업종인데도 우리 산업체제는 아직도 이 분야를 주종으로 하고 있어 시장경제를 무시한 지금 같은 정부주도형 빅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 김영삼 (金泳三) 정부 말기부터 갑자기 한국 정부가 강조해온 벤처산업도 말같이 그리 쉽게 성공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브라질.칠레 등 남미 후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10여년을 앞서 벤처산업에 관심을 두워왔건만 말이 쉽지 벤처사업으로 이들 후진국의 산업구조가 선진화 되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당장 돈만 많이 투자하면 벤처산업이 저절로 육성되는 줄 알고 지난해 5월부터 벤처기업육성특별법을 제정해 올해만도 3조8천억원의 예산을 정부 주도로 신 벤처기업에 투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결과는 구 정권 시절 농어촌 개량사업 등 지금까지의 수많은 관 주도 투자계획들처럼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고 목욕탕업이 하룻밤 사이에 벤처기업으로 둔갑해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등 고질적인 재원낭비밖에 남는 것은 별로 없을 것이 뻔하다.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IMF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형 경제체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국제화의 환경에 걸맞은 참신하고 혁신적인 정책개발과 우리 경제의 장기적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 하겠다.
박윤식 美조지워싱턴대 교수. 국제경영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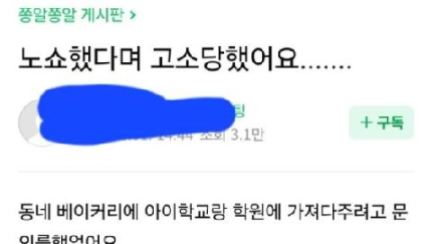
![[오늘의 운세] 6월 1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