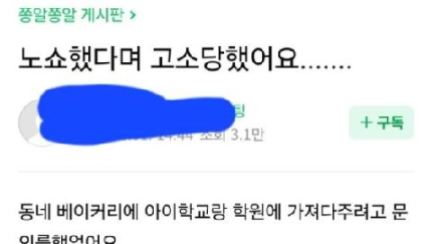방송 채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에서 방송이 차지하는 비중도 그만큼 높아지고 방송의 여론 지배력도 크게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사회적 고비 마다 방송이 여타 사회경제적인 주요 이슈보다 가장 민감한 의제로 등장하고 소요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근 30여 년을 방송 현업에 종사했고 지금도 방송 관련 단체에 몸담고 있는 방송인의 한 사람으로서 심한 자괴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1964년 방송계에 첫발을 들여 놓은 후 방송과 정권과의 관계를 현장에서 지켜보며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한탄했다. 그러면서도 국가 발전과 함께 방송이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방송의 독립성을 누릴 날이 오리라는 희망을 안고 방송사 문을 떠났었다. 이런 희망을 가진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등장한 방송 노조에 대한 기대 때문이기도 했다. 군사정권 말기 방송사에 노조가 생기면서 필자의 이런 기대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근래에는 방송 노조가 방송의 새로운 핵심 권력이 되면서 정치사회적으로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방송은 시청자이자 방송의 주인인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이며 방송이 지켜야 할 최고의 존립근거다. 방송의 주인은 경영자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노조는 더욱 아니며 오직 국민이기 때문이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너무나 자명한 명제를 들추지 않더라도 방송 제작을 책임지고 있는 방송 제작자들은 고도의 객관성·윤리성과 함께 국가와 국민에 대한 숭고한 책임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작자가 자신의 특정 이념과 가치관을 방송 제작에 이입시킨다면 그 해악은 바로 국민에게 전파되며 이것은 곧 역사에 대한 범죄라 할 수 있다.
최근 지난 정권 시절의 주요 보도 방송물과 기획 프로그램들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나 판단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 자체가 방송 제작자들에게는 크나 큰 불명예이며 치열한 반성이 요구되는 과제다. 방송 노조의 힘이 아무리 커졌다 해도 그 힘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지 자신들의 권익과 특정 이념을 위해, 또한 자신이 속한 방송사의 안위를 위해 쓰인다면 국민의 엄중한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군사정권의 언론 통제 조치에 의해 탄생한 지금의 방송체제가 우리 방송계의 고질병처럼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그 방송의 노조는 아이러니하게도 민영화가 정권의 방송 장악이라며 정권 퇴진까지 운운하며 파업과 방송 중단을 수시로 자행하고 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미디어 관련법으로 인해 우리 국회에 또 한차례 거대한 폭풍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필연적인 결과며 세계적으로 거대 미디어 기업들을 탄생시키고 있다. 미국의 타임워너나 월트 디즈니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 규모는 우리나라 지상파 매출 총합계의 26배나 된다. 우리가 이대로 간다면 격차는 더 벌어질 게 분명하고 우리의 방송은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불원간 세계적인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IT산업이 만개하기 전에는 방송은 그저 방송 고유의 기능에 충실하기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방송도 새로운 산업과 결합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게 되었다. 파이를 키우고 콘텐트를 육성하지 않으면 미디어 산업의 미래는 없으며 IT강국이라는 명예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미디어법이 투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여와 야, 노조와 사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시대가 요구하는 그릇을 준비해야 먹거리를 담을 것이 아닌가?
장한성 사단법인 한국방송인회 회장
![[오늘의 운세] 6월 1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