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을 뜨겁게 달구었던 올림픽의 쾌거가 수학교육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었다. 태릉선수촌에서 과학적인 체력 강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수학이 그 기초 이론을 제공한다는 의미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수학교육의 현실을 냉소적으로 그린 씁쓸한 유머였다. 중·고교의 수학 공부는 그 자체가 극기훈련이자 지옥훈련이기 때문에, 올림픽 대표 선수들이 혹독한 육체적 훈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의미였다. 수학에 대한 일반인의 정서를 잘 드러낸 유머다.
최근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리영역에 대한 개편안이 공개되었다. 현재 중학교 3년생이 치르게 될 수능부터는 인문계열 학생이 응시하는 수리 나형에 미적분이 추가된다는 것이다. 공청회를 거쳐 연말에 최종안이 결정되지만 현재로는 거의 확정적이다.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인문계열 학생들은 미적분을 배우지 않고, 수리 나형에도 미적분이 포함되지 않는다. 인문계열 전공 중 미적분이 필요한 경영대학이나 경제학과에서는 이런 현실을 개탄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2008학년도 수능에서 수리 가형을 선택한 학생은 24.2%에 불과했지만 수리 나형을 택한 학생은 75.8%에 달했고, 수리 나형에 응시한 학생 중 상당수는 자연계열로 교차 지원을 했다. 지난해 77개 4년제 대학의 정시모집을 통해 입학한 공대생의 61.1%가 수리 나형 응시생이었으니, 대학에서 대규모의 미적분 추가 교육이 불가피하다.
제7차 교육과정 개정 과정을 되돌아보면 1997년 당시에도 문과 수학에 미적분을 포함시키느냐의 문제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 당시 수학은 사교육을 유발시키는 주범으로 인식돼 범위를 축소하고 수준을 하향 조정하면 사교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여론이 강했다. 미적분은 가장 어려운 내용으로 인식됐기에 미적분을 문과 수학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다.
수학계의 저항도 적지 않았다. 미적분은 변화 현상에 대한 변화 정도를 다루는 동적인 수학이자 수학적 사고의 정수를 보여 주는 학교 수학의 절정인데,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이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실제 몇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미적분은 포함과 삭제 사이를 오가다 결국 삭제로 결론지어졌다. 그렇지만 제7차 교육과정을 개정한 2007년의 수정 고시안에서는 미적분을 부활하기에 이르렀고, 2012학년도 수능도 이를 따르게 된다.
한 국가의 경쟁력은 과학기술의 발전 수준을 넘어설 수 없고, 과학기술의 수준은 수학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다소 식상한 논리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수학이 중요하다는 점은 이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은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과목을 배정해야 하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수학의 비중이 늘어나면 어느 과목인가에서는 축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유독 수학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과목이기주의처럼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수학적 사고는 자연과학과 공학뿐 아니라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적 탐구의 펀더멘털이 되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특별 대우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수학 교육과정은 수학 선택과목을 더 다양화하고 성격을 차별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수학 영재를 위한 과목에서는 높은 수준까지 심화시킨 수학 내용을 추상적으로 설명하고, 대다수 학생이 배우는 과목에서는 내용의 엄밀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실생활과 접목시킨 예를 통해 직관적이고 비형식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차별화를 통해 수학 영재들의 지적 탐구심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평범한 학생들의 수학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는 윈윈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박경미 홍익대교수·수학교육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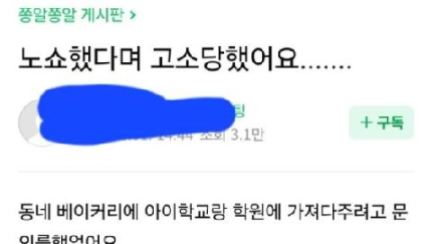
![[오늘의 운세] 6월 1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